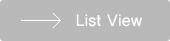Ⅰ. 서론
심혈관질환은 관상동맥 심장질환 및 울혈성 심 부전, 심장마비 등 심장 또는 혈관과 관련된 모든 질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4년도부터 2021년까 지 8년간 국내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변화를 살 펴보면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암의 뒤를 이어 가장 높았으며,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61.5명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다[1].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인자로 흡연 및 스트레스, 우울증, 주관적 건강인지[2],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3], 치 주질환[4], 혈당[5] 등이 있다. 이는 심혈관질환이 개인의 건강 및 생명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 자 일상생활 습관 및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심혈관질환 문제는 다인가구와 비교했을 때 1인가구에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와 달리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적으로 건강행위에 관여하거나 지지해줄 가족 구성원이 없으므로[6] 심혈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이 통제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돌연사 를 일으키는 주요 기저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7] 은 심혈관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홀로 삶을 영위하는 1인가구 구성원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연사한다면 시신이 일정기간 방치된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 문제는 고독사의 한 역학적인 원인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 면 심혈관질환의 한 측면인 동맥경화증 이환위험 수준을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유병상태로 구분하여 예측요인 분석을 시도하거나[8] 심혈관질 환과 관련된 5가지 건강지표와 위험도 분류방법을 활용하여 심혈관질환 위험 예측요인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있었다[9]. 이들 연구는 1인가구의 심혈관 질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1인 가구 내 성별 및 연령별로 위험 예측요인을 분석 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임의의 척도를 활용하거나 연구에 사용한 패널데이터 특성상 척 도 구성에 제한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 할 수 있다. 그 외 다인가구와 1인가구간 심혈관질 환 발병 위험도 비교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10].
국내외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도구는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국외 척도로는 Framingham Risk Score, ACC/AHA 심뇌혈관질 환 예측모형, QRISK가 있으며 국내 척도로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 뇌졸중 및 심장질환 예측, 한국인 위험 예측모형, 국가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11], 그리고 KOSHA 모형과 한국인 허혈 성심질환 발생예측모형이 있다[12]. 본 연구는 Framingham Risk Score(FRS)를 척도로 활용하였 다. 해당 척도는 한국인의 심혈관질환 위험을 과대 추정한다는 평가도 있으나[13] 관상동맥 석회화 및 협착 정도에 높은 설명력과 더불어 유의미한 관련 성이 있는 예측지표로 보고되었다[14]. 이에 본 연 구에서는 Framingham Heart Study(FHS)의 Framingham Risk Score(FRS)를 활용하여 1인가구 의 심혈관질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요인을 분 석하고자 한다. FHS는 미국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 (NHLBI)로 알려진 미국 국립심장병연구소(NHI)에 서 1948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공통적인 요인을 규명하였고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가운 데 FRS 척도는 현재 심혈관질환이 없는 30-74세 개인을 대상으로 10년 내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등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를 측정 하는 척도이며 현재는 2018년도 척도가 고안되었 다. 본 연구는 해당 척도를 활용하여 30-74세 1인 가구의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별 예측요인을 분 석하는 한편, 1인가구 건강행태[15] 및 심혈관질환 예측요인[2]에는 성별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 하여 성별간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 위험 예측요인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성별 및 위험도별 접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별 예 측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성별간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예측요인 에는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8기 국민건 강영양조사 2019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의 연구대상은 30-74세 1인가구이므로 해당 모집단 을 구성하기 위해 우선 가구원 수가 1로 코딩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그 다음 만 나이 문항을 활 용하여 441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30-74세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 발병위험 예측요인 을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441명의 표본 가운데 뇌 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이미 심혈관질환에 이환된 표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지표 및 위험예측 변인 문항에 결측치가 확인된 표본을 제 외한 총 338명의 표본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2. 변인구성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해 활용 한 지표로 성별, 연령, 수축기 혈압, 흡연여부, BMI, 당뇨여부가 있다. 이 가운데 당뇨척도는 당뇨병의 현재 유병 여부를 묻는 문항과 함께 측정된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수치를 활용하였고 기준 수치는 공복혈당이 126㎎/dL 이상, 당화혈색소는 6.5% 이 상인 경우 당뇨 유병상태로 보았다. 한편, 지표는 성별 및 고혈압 치료여부에 따라 계수가 다르게 적용되며, 계수의 총합은 Framingham 공식에 의 해 Risk Score로 변환되어 심혈관질환 10년 내 발 병위험 확률을 나타낸다. FRS척도를 사용한 연구 를 살펴보면 발병 위험률 10% 이하 저위험군, 11-20% 중등도 위험군, 21% 이상 고위험군으로 분 류하거나[10][16], 발병 위험률 10% 이하, 10-15%, 15-20%, 20% 이상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 도한 연구[14], 그리고 발병 위험률 20%를 기준으 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눈 연구[17]가 있었 다. 각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발병 위험률 10% 기 준으로 저위험군을 구분하고 발병 위험률 20%를 기준으로 고위험군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병 위험률 10%를 저위험군, 20%를 고위험군으로 구분하고자 한다<Table 1>.
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을 예측하는 변인은 교육수 준, 가구소득,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여부, 우울감, 치통경험, 이상지질혈증, 에너지 섭취수준, 탄수화 물 및 단백질, 지방 섭취수준으로 구성된다. 교육 수준은 교육수준 재분류 코드 문항을 활용하여 중 졸 이하(0)와 고졸 이상(1)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 소득은 가구소득의 4분위를 나타낸 문항을 활용하 여 중하 이하(0)와 중상 이상(1)으로 구분하였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여부는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 율 항목을 활용하여 미실천(0)과 실천(1)으로 구분 하였고 우울감은 2주이상 연속 우울감 여부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여 비해당(0)과 해당(1)으로 구분하였 다. 치통경험은 지난 1년간 치통을 경험했는지 여 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미경험(0)과 경험(1)으 로 구분하고 이상지질혈증은 해당 질환의 유병상태 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비해당(0)과 유병상태(1) 로 구분하였다. 한편 영양소 섭취수준 기준은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근거로 한 다[18]. 칼로리 섭취기준의 적정여부는 연구대상의 일일 에너지 섭취량을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일일 필요추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산출된 수치가 75-125% 수준이면 적정(0), 75% 미만 또는 125%를 초과하면 적정하지 않은 것(1)으로 코딩하였다. 탄 수화물과 단백질은 일일 섭취량(g)에 4(㎉)를 곱하 여 열량을 계산하였으며, 지방은 일일 섭취량(g)에 9(㎉)를 곱하여 열량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열량은 일일 필요추정량으로 나누어 각각 비율을 산출하 였다. 탄수화물은 필요추정량 대비 55-65%면 적정 (0), 55% 미만이면 또는 65%를 초과하면 적정하지 않은 것(1)으로 구분하였으며, 단백질은 필요추정 량 대비 7-20%면 적정(0), 7% 미만 또는 20%를 초 과하면 적정하지 않은 것(1)으로 구분하였다. 그리 고 지방은 필요추정량 대비 15-30%면 적정(0), 15% 미만 또는 30%를 초과하면 적정하지 않은 것 (1)으로 구분하였다<Table 2>.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 발병위험지표 및 예 측 변인별 특성에 성별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그리고 심 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별 예측요인의 성별 차이 여 부를 검증하고자 성별로 각각 회귀모형을 구성하 여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단, 위험지 표에 연령이 포함되어있으므로 독립변인에 연령변 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통계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 했으며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비교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지표에 대한 일반적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성비는 남성 1인가 구가 42.9%, 여성 1인가구가 57.1%로 여성의 비율 이 높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57.32±12.69세이 며 여성 1인가구의 평균 연령은 61.31±10.36세, 남 성 1인가구의 평균 연령은 52.01±13.57세이다. 수 축기 혈압의 평균 수치는 고혈압 치료 이력 여부 에 따라 분류하여 계산하였다. 고혈압을 치료한 이 력이 없는 연구대상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119.74± 17.27mmHg이며, 남성 1인가구의 평균 수축기 혈 압은 119.85±15.51mmHg, 여성 1인가구의 평균 수 축기 혈압은 119.64±18.70mmHg이다. 고혈압을 치 료한 이력이 있는 연구대상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130±13.40mmHg이며 남성 1인가구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131.13±11.14mmHg이고 여성 1인가구의 평 균 수축기 혈압은 129.47±14.49mmHg이다. 연구대 상의 흡연율은 27.5%이며 남성 1인가구의 흡연율 은 49.0%, 여성 1인가구의 흡연율은 11.4%이다. 연 구대상의 평균 BMI 지수는 24.21±3.36㎏/㎡이며, 남성 1인가구의 평균 BMI 지수는 24.77±3.26㎏/㎡, 여성 1인가구의 평균 BMI 지수는 23.79±3.38㎏/㎡ 이다.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지표의 함수계산을 통해 측정된 10년 내 발병 위험률은 10%와 20%로 구분되며 각 위험률에 따른 연구대상의 비율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 가운데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률이 10% 이상인 비율은 55.3%이며, 남성 1인 가구는 60.7%, 여성 1인가구는 49.2%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리고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률이 20% 이상인 비율은 전체 연구대상의 26.6%이며, 남성 1 인가구는 40.0%, 여성 1인가구는 16.6%로 나타났 다. 이 가운데 성별간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 지 표는 연령, 흡연율, BMI였으며 발병 위험률 10% 및 20%에 대한 성별간 비율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2. 변인별 특성 분석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예측 변인에 대한 특성 분석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 비율이 55.3%이며, 남성 1인가구의 고졸 이상 비율은 71.0%, 여성 1인가구의 고졸 이상 비율은 43.5%이다. 연구대상의 가구소득 수준은 중하 이하 의 비율이 68.6%이며, 남성 1인가구의 중하 이 하 소득비율이 75.2%, 여성 1인가구의 중하 이하 소득비율은 63.7%이다. 연구대상의 유산소 신체활 동 실천율은 35.2%이며, 남성 1인가구의 실천율은 32.4%, 여성 1인가구의 실천율은 37.3%이다. 우울 감을 느끼는 연구대상의 비율은 16.9%이며, 남성 1 인가구는 16.6%, 여성 1인가구는 17.1%가 우울감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가운데 지난 1년간 치통을 경험한 비율은 29.3%이며, 남성 1인 가구의 31.0%, 여성 1인가구의 28.0%가 각각 경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20.1%이며, 남성 1인가구의 유병률은 13.1%, 여성 1인가구의 유병률은 25.4%였다. 연구 대상의 칼로리 섭취수준은 권장 수준 대비 75~125% 수준으로 적정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50.9%이며, 남성 1인가구의 54.5%, 여성 1인가구의 48.2%가 적정 수준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섭취수준이 55~65%로 적정하게 섭취하 는 연구대상의 비율이 17.8%이며, 남성 1인가구의 15.2%, 여성 1인가구의 19.7%가 탄수화물을 적정 비율로 섭취하고 있다. 단백질 섭취수준이 7~20% 로 적정하게 섭취하는 연구대상의 비율이 72.5%이 며, 남성 1인가구의 69.0%, 여성 1인가구의 75.1% 가 적정 수준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방 섭취수준이 15~30%로 적정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36.7%이며, 남성 1인가구의 40.0%, 여성 1 인가구의 34.2%가 적정 수준의 지방을 섭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수준, 가구소득,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에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3. 연구대상의 심혈관질환 위험도별 예측요인
연구대상의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별 위험 예 측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일 때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가 10% 이상일 가능성은 0.2배(0.1-0.3), 발병 위험도가 20% 이상일 가능성은 0.3배(0.2-0.6)로 낮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상 이상인 경우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가 10% 이상일 가능성은 0.2배(0.1-0.4), 20% 이상일 가능성 은 0.1배(0.04-0.3)로 낮다. 한편 유산소 신체활동을 했을 때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가 10% 이상일 확 률은0.5배(0.3-0.9)로 낮고, 이상지질혈증 유병상태 에 있는 경우 3.7배(1.8-7.8)로 높다<Table 5>.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 in individuals living alone
 |
4. 성별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 위험도별 예측요 인
남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도에 따른 위험 예측요인을 살펴보면, 발병 위험도 10%를 기준으로 교육수준, 가구소득,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 이상지질혈증, 탄수화물 섭취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남성 1인가구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인 경우 발병 위험도가 10% 이상일 확률은 0.1배(0.01-0.3)로 낮고, 가구소득이 중상 이상일 때 에도 0.1배(0.02-0.2)로 낮다. 그리고 유산소 신체활 동을 실천했을 때 발병 위험도가 10% 이상일 확률은 0.3배(0.1-0.8)로 낮고, 이상지질혈증 유병 상태일 때에는 10.7배(1.1-102.5)로 높다. 한편 탄수 화물 섭취수준이 결핍 또는 과잉 상태로 적정하지 않았을 때 발병 위험도가 10% 이상일 확률이 0.2 배(0.05-0.8)로 낮았는데 이는 해석상 주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20%를 기준으로 교육수준, 가구소득, 치통경험, 이상지질 혈증, 칼로리 섭취수준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 되었다. 남성 1인가구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인 경우 위험도가 발병 20% 이상일 확률은 0.1배 (0.03-0.3)로 낮고, 가구소득이 중상 이상일 때에도 0.1배(0.02-0.4)로 낮다. 지난 1년간 치통을 앓은 경 험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도가 20% 이상일 확률은 2.9배(1.0-8.0)로 높고, 이상지질혈증 유병상태인 경 우 5.2배(1.2-21.4)로 높다. 그리고 칼로리 섭취가 결 핍 또는 과잉상태로 적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병 위 험도가 20% 이상일 확률은 3.9(1.3-11.9)배로 높다.
여성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10%를 기준으로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 이상지질혈증이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여성 1인가구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일 경우 발병 위험도가 10% 이상일 확률 은 0.1배(0.1-0.2)로 낮고,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일 때에는 0.4배(0.2-0.9)로 낮다. 한편 이상지질혈증 유병상태인 경우 발병 위험도가 10% 이상일 확률 은 3.7배(1.6-8.9)로 높다.
여성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 위험도 20%를 기준 으로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1인가구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 일 때 위험도가 20% 이상일 확률은 0.2배(0.1-0.5) 로 낮고, 가구소득이 중상이상일 경우에도 0.2배 (0.05-0.6)로 낮다<Table 6>.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30-74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Framingham 척도를 활용하여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요인 에 대해 성별간 비교분석하였다. 성별간 심혈관질 환 위험지표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높고, 흡연비율 및 BMI 지수는 남성 1인가구가 높다.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를 살펴보면 10% 이상 및 20% 이상 위험도에 포함되는 비율 또한 남성 1인가구가 높 다. 이어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한 결과를 살펴보 면, 남성 1인가구는 고졸 이상 비율이 여성 1인가 구보다 높고, 여성 1인가구는 가구소득이 중상 이 상 및 이상지질혈증 이환 비율이 남성 1인가구보 다 높다.
30-74세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예측하 는 요인을 살펴보면 모든 회귀모형에서 교육 및 소득수준이 공통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및 소 득수준이 낮으면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고 [19] 또한 심혈관질환에 이환된 상태에서도 사회경 제적 수준이 낮으면 생활습관을 개선하거나 양질 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20]. 그러나 다인가구와 비교했을 때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에 노출될 위험은 크지만, 심혈관질환 위험과 소득수 준간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 [10]와 배치된다.
공통요인을 제외한 남성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와 비 교했을 때, 남성 1인가구의 동맥경화증 위험요인이 신체활동여부, 식생활 문제 등이 예측된 연구[8]나 다른 척도를 이용해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인이 혈 당, 신체활동여부로 확인된 연구[9]와 일맥상통하 는 부분이 있다. 먼저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했을 때 발병 위험도 10% 이상에 포함될 확률이 낮고, 이상지질혈증 유병상태인 경우 위험도 10% 이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1년 이상 치아통증 경 험, 이상지질혈증 유병상태, 적정 수준의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 발병 위험도 20% 이상에 포함 될 확률이 높다. 공통요인을 제외한 여성 1인가 구의 심혈관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요인이 발병 위 험도 10%를 기준으로 이상지질혈증 유병상태인 것 과 비교했을 때 남성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 위험 을 예측하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지질혈증은 다른 질환과 동반하여 심 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21], 치주조직이 세균과 그것이 생산하는 부산물, 염증 등에 노출되어 혈관 을 통해 다른 조직에 악영향을 미쳐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4], 그리고 영양섭취수준이 불균형하면 심혈관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22] 는 기존 연구결과와 함께 남성 1인가구는 식습관 이나 건강관리 등 생활관리를 미흡한 경향이 있었 다[23]. 남성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 발병 문제는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생활관리가 미흡한 성별 특성의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남성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 예방은 생활습관의 개 선 차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탄수화물 섭취 수준이 적정하지 않았을 때 발병 위험도 10% 이상 에 포함될 확률이 오히려 낮았는데 이는 해석상에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 1인가구는 공통요인을 제외하고 이상지질 혈증 유병상태가 위험도 10% 수준에서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남성 1인가구와 비교했을 때 비 교적 단순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가구에 비해 평균 연령 및 이상지 질혈증 유병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따 라서 이상지질혈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생활습 관 개선과 함께 중장년 이상 고연령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상지질혈증 및 그와 동반되는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헬스 리터러시 능력을 향 상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년 도 자료를 활용하여 30-74세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요인에 대해 성별간 비교분 석을 하였다.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홀로 삶을 영위하다 급작스럽 게 사망하는 돌연사와 그와 역학적 관련성이 높은 심혈관질환 위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예측요 인 분석을 통해 예방학적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성별간 심혈관질환 발병위험 예 측요인을 비교분석하여 1인가구의 심혈관질환 발 병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별간 접근 방법 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심혈관질환은 지속적으로 건강습관이나 문제가 누적되어 발현되 는 질환이므로 본 연구처럼 1개년도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횡단면적 접근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변인 및 발 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요인을 구성하는 가운데 결 측값을 갖는 표본은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로 인해 모집단의 대표성이 편향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더욱 정교 한 연구모형 설계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