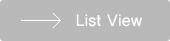Ⅰ.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2018년 65세이상 인구 비율은 14.3%로 고 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20%가 넘는 초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1].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는 치매 환자와 이에 동반된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치매 환자 수 증가는 치매관리비용으로 인한 사회・경제 적 부담 증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저하 등 의 문제로 이어진다[2].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도 2010년 8.7%(47.4만명)에서 2020년 10.3%(83.2만명), 2030년 10.5%(136만명), 2050년에는 15.9%(302.3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1].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08년 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추진하 면서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면서 국가적 치매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다. ‘제3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2016년~2020년)’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치매진단‧치료‧돌봄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 치매연구‧통계와 같은 인프라 확충 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4]. 본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제4차 국가치 매관리 종합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다[3]. 2017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여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확대·설치하고, 장기요양 등급 확대,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시행 하였다[3]. 또한 치매노인들을 서로 돕는 치매안심 마을 조성사업과 치매파트너스 양성 사업 및 치매 극복 선도학교사업을 확대 실시하였다[3].
그중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2020년 기준 339 개소를 운영하여 양적 확대를 이루었고, 국민의 51%가 국가치매정책이 치매인식 변화에 긍정적으 로 기여했다는 평가했지만,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 식 해소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 치 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서, 치매환자와 가족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주민들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 드는 사업이다[3]. 특히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데[4], 치매 및 치매노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을 개선하여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은 매우 의미가 있다[5].
2018년부터 남해군지역(덕신, 선소, 남정마을)에 서는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생활터 치매행복마을(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총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3]. 남해군은 경상남도 지역 중 65세 이상 인 구가 15,809명(전체 인구의 35.91%)으로 합천군 (36.93%) 다음으로 높으며, 치매환자 추정자가 2,121명(65세 이상 인구 중 13.41%)으로 의령군 (13.15%)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7], 시범 사업을 통한 관리모델 정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시범사업은 치매안심마을 모형 마련, 치매조기예 방, 인식개선 및 치매 안전망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을 목적으로 하는데, 치매행복마을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지속성’과 ‘인식개선 효과’이다[3]. 시범사 업 기간 중 남해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가 시범마 을 마을회관에 월 2회 방문해 치매예방 교육과 인 지강화 프로그램 지원, 건강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벽화그리기 활동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 정적 인식개선에 힘쓰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마을 내 청소년, 청・장년, 노인을 포함해 전 연령 의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과 마을환 경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의미 가 있다[8].
본 사업에서 중점을 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태도를 평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에 대한 태도를 정의하 면, 치매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경 향을 말하며[9], 치매라는 질병이나 치매환자에 대 한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부정 적·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10]. 치매에 대한 인식 은 치매에 대한 정보와 지식 정도를 의미하며 이 는 질병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질병관리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11], 치매 인식에 관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치매지식 수준을 다루고 있 다[12].
기존의 치매 지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나이 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상황이 좋 을수록 치매 지식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13][14]. 또한 치매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이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치매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15][16], 치 매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9] [10][13][14]. 일부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매 지식이 높을 수록 치매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치매에 대한 태도 가 긍정적일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17].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들은 주로 일반 지역주민[18][19], 대학생[17], 노인 [10][13][14], 중·장년층[20], 간호사 및 돌봄제공자 [21]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 후 시범 운영 중인 치매행복마을 사 업이 추구하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를 평가 할 수 있는 연구가 전무한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남해군의 치매 안심마을을 시범 운영 중인 마을 3곳과 일반마을 3곳을 선정하여 치매 지식과 치매 태도 수준을 비 교하고, 각 마을별 치매 지식과 치매 태도의 연관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의미있는 결과 가 도출시 사업의 환류시스템과 관련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해군 소재 치매행복마을 시범지역 (덕신, 선소, 남정마을)과 일반마을(천동, 고암, 선 구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A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실시되었다(IRB 승인번호: KNU_IRB_2019_81)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해 산출하였으며, t-tests- Means: Difference between two independent means(two groups), Effect sized 0.5, a error prob 0.05, Power((1-β err prob alpha) 검정력은 0.095, 양측 검정으로 계산하여 실험군 105명, 대조군 105명으로 총 210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편의모집으로 표본을 추출 하였으며, 남해군에 거주하는 치매 조기 검진 실시 대상 연령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연구의 모집단으 로 선정하였고, 국문해독이 가능하여 질문지의 내 용을 듣고 이해하여 응답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연구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탈락자를 고려하여 262명을 표본으로 정하여 2019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하였으며, 이중 결측치가 없는 253명(치매행복마을 112명과 일반마을 141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3. 변수 정의
1) 종속변수 : 치매에 대한 태도
태도란 사람의 행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표현한 단어이다[26].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치매에 대 한 정서적, 행동적 태도를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 다. 치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Cho[22]의 논문에서 사용한 1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치매환자는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등 의 부정적인 정서적 태도를 나타내는 5문항과 ‘치 매를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다‘ 등의 긍정적 행동적 태도를 나타내는 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게 측정된 ‘치매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사회적인 문제 는 아니다’ 문항을 제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5점 척도로 정말 그렇다(5점)~ 전혀 그렇 지 않다(1점)로서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점수가 높 음을 의미한다. Cho[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0.66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0.644이었다.
2) 독립 변수 :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인식은 치매에 대한 정보와 지식 정도를 의미하며[15], 지식이란 치매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치매의 원인 질환, 증상, 예방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분 별·판단하여 자신이 지각한 치매에 관해 아는 지 식을 말한다. 치매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의 ‘치매노인 유병률 조사’를 위해 개발한 도구[27]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전 조사를 통해 17문항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 는 1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정답 과 일치할 경우 1점, 일치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였고, 역문항에 대해 서는 역으로 점수를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며, 점수 범 위는 0점에서 15점이었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0.87로 비교적 높았다.
3)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 하였다. 학력의 경우 고졸인 경우는 치매행복마을 은 0명, 일반마을은 4명으로 확인되었는데, 4명으 로 고졸을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중졸이상으 로 묶어서 재분류하였다. 경제적 만족도도 충분하 다고 응답한 경우가 치매행복마을은 4명, 일반마을 은 1명으로 확인되어 보통 이상으로 묶어서 재분 류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 24.0 통계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치매행복마을과 일반마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치매행복마을과 일반 마을 간 치매지식과 치매태도의 차이는 t-test를 사 용하였고, 치매행복마을과 일반마을 각각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에 따른 치매지식과 치매태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 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로 하였다. 치매안심마을 과 일반마을의 치매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연구 결과, 치매안심마을과 일반마을 간 연령 과 학력, 취업 여부, 경제적 상태, 치매에 대한 정 보 습득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연령은 치매안심마을이 71세 이상이 92.9%, 일 반마을은 78.1%로 치매안심마을이 전반적으로 고 연령자의 분포가 많았으며(p<0.000), 학력은 치매 안심마을은 초졸 이하가 94.7%, 일반마을은 90.1%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치매안심마을의 저학력자 분 포가 많았다(p<0.05). 취업여부는 취업자가 치매안 심마을이 8.0%, 일반마을이 36.9%이었고(p=0.000), 경제상태는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치매안심마을이 58.0%, 일반마을은 46.8%로 나타났다(p<0.05). 치매 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에서도 두 마을 간 차이를 보였는데, 치매안심마을은 보건소 프로그램 및 홍 보자료가 68.6%로 가장 많았고, 대중매체 52.3%, 이웃·친척 20.9%. 전문의료인 4.7%순으로 나타났는 데, 일반마을은 대중매체가 51.0%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소 프로그램 및 홍보자료 42.3%, 이웃·친척 16.3%, 전문의료인 7.7%순이었다(p<0.01). 그 외 성 별, 배우자 여부, 종교, 심리적으로 교류하는 사람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치매환자 접한 경험 변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unit=n(%)
| Variables | safety village (n=112) | general village(n=141) | total (n=253) | χ2 | p | |
|---|---|---|---|---|---|---|
|
|
||||||
| Gender | man | 22(19.6) | 26(18.4 | 48(19.0) | 0.057 | 0.814 |
| woman | 90(80.4) | 115(81.6) | 205(81.0) | |||
| Age | under 70 | 8(7.1) | 31(21.9) | 39(15.4) | 20.755 | 0.000 |
| 71-80 | 62(55.4) | 82(58.2) | 144(56.9) | |||
| 81+ | 42(37.5) | 28(19.9) | 70(27.7) | |||
| Education | None | 66(59.3) | 58(40.8) | 124(49.0) | 9.984 | 0.021 |
| elementary | 40(35.4) | 69(49.3) | 109(43.1) | |||
| middle | 6(5.3) | 14(9.8) | 20(7.9) | |||
| Spouse | no | 73(65.2) | 78(55.3) | 151(59.7) | 2.517 | 0.113 |
| yes | 39(34.8) | 63(44.7) | 102(40.3) | |||
| Employment status | no | 103(92.0) | 89(63.1) | 192(75.9) | 27.451 | 0.000 |
| yes | 9(8.0) | 52(36.9) | 61(24.1) | |||
| Economic satisfaction | commonly+ | 47(42.0) | 75(53.2) | 122(48.2) | 7.562 | 0.028 |
| insufficient | 65(58.0) | 66(46.8) | 131(51.8) | |||
| Religion | not have | 55(49.6) | 59(41.8) | 114(45.1) | 1.641 | 0.205 |
| have | 57(50.4) | 82(58.2) | 139(54.9) | |||
| P s y c h o l o g i c a l interaction | no | 44(39.3) | 55(39.0) | 99(39.1) | 0.006 | 0.921 |
| yes | 68(60.7) | 86(61.0) | 154(60.9) | |||
| Subjective health status | not healthy | 43(38.4) | 49(34.8) | 92(36.4) | 0.727 | 0.632 |
| commonly | 52(46.4) | 74(52.4) | 126(49.8) | |||
| healthy | 17(15.2) | 18(12.8) | 35(13.8) | |||
| Information acquisition path for dementia (double respance) | mass media | 45(52.3) | 53(51.0) | 98(51.6) | 19.484 | 0.002 |
| medical professional | 4(4.7) | 8(7.7) | 12(6.3) | |||
| neighbors, relatives | 18(20.9) | 17(16.3) | 35(18.4) | |||
| Public health center programs | 59(68.6) | 44(42.3) | 103(54.2) | |||
| Experience with dementia patients | no | 77(68.8) | 110(78.0) | 187(73.9) | 2.635 | 0.105 |
| yes | 35(31.2) | 31(22.0) | 66(26.1) | |||
|
|
||||||
| Total | 112(44.3) | 141(55.7) | 253(100) | |||
2. 치매안심마을과 일반마을 간 치매태도와 지 식의 차이
치매안심마을과 일반마을 간 치매 태도와 지식 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치매 태도는 치매안 심마을의 평균은 3.31점/5점이고 일반마을의 평균 은 3.32점/5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치매 지식은 치매안심마을 의 평균은 7.15점/15점(정답율 47.7%), 일반마을의 평균은 8.01/15점(정답율 53.4%)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Differences of Variables
| Variables | safety village | general village | t | p |
|---|---|---|---|---|
| Mean±SD | Mean±SD | |||
|
|
||||
| Dementia Attitudes | 3.31±0.54 | 3.32±0.37 | -0.22 | .824 |
| Dementia knowledge | 7.15±2.23 | 8.01±1.93 | -2.57 | .011* |
*p<0.05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치매 지식의 차이
치매안심마을과 일반마을 대상자들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따른 치매 지식수준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치매지식을 15점 만점으로 측정되었으 며, 치매행복마을의 경우 연령과 학력, 심리적 교 류인 유무에 따라 치매 지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70세 이하는 8.25점이고, 71~80세 6.86점, 81~90세 5.57점으로 나이가 젊을 수록 치매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고(p<0.01), 학 력에 따라서는 무학(6.85점), 초졸(7.33점), 중졸이상 (9.33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았다 (p<0.05). 심리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6.50점)보다 있는 경우(7.57점)에 높았으며(p<0.05), 그 외 변수들은 치매 지식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Differences in Dementia knowledg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Variables | safety village(n=112) | general village(n=141) | |||
|---|---|---|---|---|---|
| Mean±SD | t/F | Mean±SD | t/F | ||
| Gender | man | 7.09±2.27 | -0.131 | 7.92±1.79 | -0.077 |
| woman | 7.16±2.40 | 7.96±2.04 | |||
| Age | under 70a | 8.25±1.75 | 5.693** a>b>c | 8.61±1.82 | 2.323 |
| 71-80b | 6.86±2.62 | 7.94±1.72 | |||
| 81+c | 5.57±2.57 | 7.17±3.00 | |||
| Education | Nonea | 6.85±2.36 | 3.336* a,b<c | 7.14±1.83 | 9.451*** |
| elementaryb | 7.33±2.16 | 8.61±1.88 | |||
| middle+c | 9.33±2.80 | 8.72±1.56 | |||
| Spouse | no | 7.00±2.39 | -0.993 | 7.55±1.76 | -2.713** |
| yes | 7.47±2.38 | 8.44±2.15 | |||
| Employment status | no | 7.04±2.33 | -1.726 | 7.66±1.73 | -2.121* |
| yes | 8.44±2.51 | 8.44±2.30 | |||
| Economic satisfaction | commonly+ | 7.86±2.11 | 2.341 | 8.61±1.76 | 9.254** |
| insufficient | 6.79±2.34 | 7.18±1.84 | |||
| Religion | not have | 7.05±2.45 | -0.430 | 7.41±2.14 | -2.823** |
| have | 7.25±2.29 | 8.34±1.78 | |||
| Psychological interaction | no | 6.50±2.34 | -2.383* | 7.58±1.90 | -1.775 |
| yes | 7.57±2.30 | 8.19±2.01 | |||
| Subjective health status | not healthya | 7.12±2.26 | 2.998 | 9.11±1.75 | 5.838** a ≻c |
| commonlyb | 7.68±2.16 | 8.07±1.91 | |||
| healthyc | 6.51±2.54 | 7.35±2.00 | |||
| Experience with dementia patients | no | 7.09±2.27 | -0.406 | 8.05±2.06 | 1.067 |
| yes | 7.29±2.60 | 7.61±1.73 | |||
*p<0.05, **p<0.01, ***p<0.001
일반마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치매 지 식수준은 학력, 배우자 유무, 취업여부, 경제만족 도,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무학(7.14 점), 초졸(8.61점), 중졸이상(8.72점)으로 무학보다 초졸과 중졸에서 지식수준이 높았고(p<0.001), 취 업을 안한 경우(7.66점)보다 취업을 한 경우(8.44점) 에 높게 나타났다(p<0.05). 경제적으로 보통이상 (8.61점)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부족한 경우(7.18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주관적 건강 상태에 서는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9.11점)가 건강 하다고 느끼는 경우(7.35점)보다 치매 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특이한 경향을 보였다(p<0.01). 그 외 변수들은 치매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치매 태도의 차이
치매안심마을과 일반마을 대상자들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따른 치매 태도의 차이는 <Table 4> 와 같다. 치매안심마을의 경우 연령과 학력, 경제 활동 유무에 따라 치매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하는 3.85점 /5점으로 가장 높고, 81세 이상은 3,12점/5점을 보 여 나이가 적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p<0.01).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이상인 경우(3.82점), 무학인 경우에는 3.17점을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p<0.001),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3.79점)에 하지 않는 경우(3.30점) 보다 긍정적 태 도를 보였다(p<0.01).
<Table 4>
Differences in Dementia Attitud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Division | safety village(n=112) | general village(n=141) | |||
|---|---|---|---|---|---|
|
|
|||||
| Mean±SD | t/F | Mean±SD | t/F | ||
|
|
|||||
| Gender | man | 3.19±0.41 | -1.363 | 3.27±0.30 | -0.781 |
| woman | 3.37±0.58 | 3.34±0.39 | |||
| Age | under 70 a | 3.85±0.52 | 4.899** a > c | 3.82±0.26 | 5.568*** a > c |
| 71-80 b | 3.39±0.46 | 3.31±0.37 | |||
| 81+ c | 3.12±0.64 | 3.17±0.42 | |||
| Education | None a | 3.17±0.53 | 8.774*** a≺b,c | 3.20±0.36 | 5.825*** a≺c |
| elementary b | 3.53±0.50 | 3.38±s | |||
| middle+ c | 3.82±0.46 | 3.58±0.39 | |||
| Spouse | no | 3.30±0.60 | -0.849 | 3.25±0.37 | -2.907** |
| yes | 3.40±0.48 | 3.43±0.36 | |||
| Employment status | no | 3.30±0.54 | -2.641** | 3.30±0.40 | -1.172 |
| yes | 3.79±0.53 | 3.37±0.33 | |||
| Economic satisfaction | commonly+ | 3.41±0.35 | 0.756 | 3.41±0.52 | 1.237 |
| insufficient | 3.28±0.61 | 3.29±0.37 | |||
| Religion | not have | 3.29±0.59 | -0.894 | 3.25±0.37 | -2.148* |
| have | 3.38±0.52 | 3.38±0.37 | |||
| Psychological interaction | no | 3.23±0.53 | -1.592 | 3.32±0.38 | -0.128 |
| yes | 3.40±0.56 | 3.33±0.37 | |||
| Subjective health status | not healthy a | 3.29±0.47 | 0.706 | 3.63±0.32 | 7.355*** a≻b,c |
| commonly b | 3.40±0.50 | 3.29±0.33 | |||
| healthy c | 3.27±0.64 | 3.27±0.42 | |||
| Experience with dementia patients | no | 3.35±0.51 | 0.484 | 3.29±0.39 | -1.999* |
| yes | 3.30±0.65 | 3.44±0.32 | |||
**p<0.01, ***p<0.001
일반마을의 경우 연령과 학력, 배우자 여부, 종 교, 주관적 건강상태, 치매환자를 접한 경험에 따 라 치매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70세 이하는 3.82점으로 가장 높고, 81세 이상은 3,17점을 보여 나이가 적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보 였다(p<0.001).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이상인 경우 에 3.58점으로 가장 높지만 무학인 경우에는 3.20 점을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p<0.001). 배우자가 있는 경우(3.43점)에 없는 경우 (3.25점)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p<0.01), 종교가 있는 경우(3.38점)가 없는 경우(3.25점)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p<0.05), 주관적으로 본인의 건강 이 나쁘다고 인지하는 경우(3.63점)에 치매 태도가 긍정적이었다(p<0.001). 또한 치매환자를 접한 경 험자(3.44점)가 미경험자(3.29점)보다 태도가 긍정적 이었다(p<0.05).
5. 치매 지식과 치매 태도의 상관성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치매안심마을의 치매태도와 치매지식의 상관계수은 0.661, 일반마 을의 상관계수가 0.2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Table 5>
Correlation within Variables
| Variables | Attitudes | knowledge | |
|---|---|---|---|
|
|
|||
| Safety village | Dementia Attitudes | 1 | |
| Dementia knowledge | .661** | 1 | |
|
|
|||
| General village | Dementia Attitudes | 1 | |
| Dementia knowledge | .298** | 1 | |
*p<0.05, **p<0.01
6. 치매안심마을의 치매 태도 영향 요인
치매안심마을 대상자들의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치 매 지식과 단변량에서 유의미한 변수였던 인구사 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Durbin-Watson의 결과가 1.531로서 자기상관이 없 으므로 잔차의 독립성 조건이 만족된다. 독립변수 간 공차 한계는 0.1이상, 다중공선성은 10.0이상으 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Table 6>
Effect fectors on Dementia Attitude in Safety villagen=112
| B | SE | β | t | p | |
|---|---|---|---|---|---|
| (a constant) | 2.285 | 0.465 | 4.917 | 0.000 | |
| Gender | 0.255 | 0.158 | 0.184 | 1.620 | 0.109 |
| Age | -0.032 | 0.078 | -0.041 | -0.410 | 0.683 |
| Elementary school | 0.249 | 0.110 | 0.215 | 2.266 | 0.026 |
| Middle school+ | 0.530 | 0.244 | 0.203 | 2.175 | 0.032 |
| Employment status | 0.188 | 0.208 | 0.084 | 0.905 | 0.368 |
| Psychological interaction | -0.129 | 0.109 | -0.115 | -1.183 | 0.240 |
| Dementia knowledge | 0.101 | 0.022 | 0.438 | 4.557 | 0.000 |
| a. Dependent varible: Dementia Attitude b. Reference : male(0), education(ignorance=0), no employment(0), no psychological interaction(0) F=1764.356***, Dubin-Watson: 1.954, R2 = 0.476, = 0.441 |
|||||
*p<0.05, **p<0.01, ***p<0.001
독립변수들이 치매 태도에 대한 설명력 (Adjusted R2)은 44.1%이며, 학력 중 ‘초졸’과 ‘중졸 이상’, 치매에 대한 지식’ 요인이 치매 태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치매 태도에 미치는 요인 중 상대적 영 향력은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이 가장 컸으며(β =0.438), 초졸(β=0.215), 중졸이상(β=0.203) 순이었 다. 즉,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무학에 비해 초졸인 대상자와 중졸이상 대상자가 치매에 대한 태도 수 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일반마을의 치매 태도의 영향 요인
일반마을 대상자들의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치매 지 식과 단변량에서 유의미한 변수였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Durbin-Watson의 결과가 1.954로서 자기상관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 립성 조건이 만족된다. 독립변수 간 공차 한계는 0.1이상, 다중공선성은 10.0이상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Table 7>
Effect fectors on Dementia Attitude in General villagen=141
| B | SE | β | t | p | |
|---|---|---|---|---|---|
| (a constant) | 3.083 | 0.225 | 13.672 | 0.000 | |
| Gender | 0.260 | 0.099 | 0.273 | 2.615 | 0.010 |
| Age | -0.085 | 0.043 | -0.194 | -1.981 | 0.050 |
| Elementary school | 0.165 | 0.069 | 0.222 | 2.392 | 0.018 |
| Middle school+ | 0.421 | 0.159 | 0.294 | 2.655 | 0.009 |
| Spouse | 0.173 | 0.114 | 0.231 | 1.516 | 0.132 |
| Subjective health status | 0.070 | 0.050 | 0.123 | 1.389 | 0.167 |
| Religion | 0.076 | 0.066 | 0.101 | 1.162 | 0.248 |
| Experience with dementia patients | 0.197 | 0.073 | 0.222 | 2.689 | 0.008 |
| Dementia knowledge | 0.006 | 0.017 | 0.031 | 0.348 | 0.728 |
| a. Dependent varible: Dementia Attitude b. Reference : male(0), education(ignorance=0), no spouse(0), not healthy(0), no Religion(0), no Experience with dementia patients(0) F=1764.356***, Dubin-Watson: 1.954, R2 =0.386, = 0.356 |
|||||
*p<0.05, **p<0.01, ***p<0.001
독립변수들이 치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 력(Adjusted R2)은 35.6%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초졸, 중졸이상), 치매환 자와 접한 경험이었다(p<0.05). 일반마을 대상자의 경우 ‘중졸’ 요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β=0.294), 다음으로 여자(β=0.273), 초졸(β =0.222), 치매환자와 접한 경험(β=0.222), 연령(β =-0.194) 순으로 나타났다. 무학인 경우보다 중졸과 초졸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 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치매안심마을과 일반마을을 비교하 면,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 었다.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 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 나, 일반마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일반마을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치매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치매안심마을 에서는 이 요인들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치매안심마을의 경우 중졸보다 초졸의 영향력 이 컸으나, 일반마을의 경우 초졸보다 중졸의 영향 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치 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을 활용 한 마을형 치매 안전망 구축 추진 사업을 시범적 으로 운영 중인 남해군 치매안심마을과 일반마을 의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우선 독립변수로 사용된 치매 지식 수준은 15문 항 중 치매안심마을 7.15점(정답율 47.7%)과 일반 마을 8.01점(정답율 53.4%)으로 나타났다. 일반 성 인(18세~70세)을 대상으로 한 조현오의 연구[18]에 서는 16점 만점에 8.63점(정답율 53.9%), 중년 성인 을 대상으로 한 김정아 등의 연구[23]에서는 23문 항 중 15.8점(정답율 68.7%)을 보여 본 연구 결과 보다 높았다. 하지만 도농복합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는 도시지역 노인이 평균 8.34점(정 답율 52.1%), 농촌지역 노인이 평균 8.27점(정답율 51.6%)으로 보고하였고, 농촌과 도시노인을 비교한 연구[14]에서도 도시노인은 8.86점(정답율 58.4%), 농촌노인은 8.30점(정답율 55.6%)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치매안심마을이 일반마을에 비해 치매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우선 두 마을의 대상자 특성을 살펴보면, 치매안심마을 이 고령, 무학과 여성노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을 측정한 경제만족도에서 부족 하다는 비율이 많았다. 반면, 일반마을은 치매안심 마을에 비해 연령이 낮았으며, 학력은 높았고, 취 업자 비율이 높아 경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 다. Parr[14]의 연구에서도 농촌노인의 경우는 나이 가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소득이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와 같 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기적인 보 건소 프로그램 및 홍보자료를 통해 치매 정보를 제공한 치매안심마을이 일반마을에 비해 치매 지 식수준이 낮다는 결과는 연구대상자 특성을 고려 한 치매관련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치매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치매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가 치매안심마을은 보건소 프로그램 및 홍보자료가 가장 많았지만 이웃·친척으로부터 정 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일반마을에 비해 높았고, 전 문 의료인으로부터 받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미루 어 볼 때,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im[19]의 연구 에서도 치매지식이 치매에 대한 인지적 태도를 변 화시켜 치매 친화적 행동을 유도하므로, 올바른 정 보와 지식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으 므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습득된 치매지식 및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치매 태도는 치매안심마을 은 3.31/5점과 일반마을은 3.32/5점으로 두 마을 간 태도 수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 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는 3.89/5점으 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 간 태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은 평균 31.43/5점, 도 시노인은 평균 32.9/5점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보 다 약간 낮게 보고하였다. 하지만 중년층을 대상으 로 한 Kim & Jung[10]에서는 3.43/5점으로 본 연 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Moon & Cho의 연구 [16]에서는 2.72/5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교육 경험이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태도 수준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 과,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양한 연구 에서 지식과 태도가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어서[10][13][19], 치매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치매 지식을 높이는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 구 결과, 일반마을의 경우에는 치매에 대한 지식은 상관분석에서는 양(+)의 상관성은 있었지만 통제변 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태도를 3개 영역(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분석한 연구 [19]에서도 치매지식이 높을수록 인지적 태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서 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여 일반마을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일반마을은 치매 지식보다 통제변수 중 학력과 성별, 치매환자와 접한 경험이 치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일률적인 지식 기반 의 치매교육이나 치매홍보에서 벗어나 대상자 맞 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치매환자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등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후 시범 운영 중인 치매안심마을 사업이 추구하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최초의 연구라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치매안심마을 대상자 들의 치매 지식이나 치매 태도를 사전. 사후 측정 을 하지 못하였고, 비교를 위한 두 집단의 동질성 을 확보되지 못하여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매안심마을에서 시행 중인 치매 관 련 교육과 치매 파트너 활동 등이 치매 태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증적 연구 이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마을과 일반마을 각각의 치매 태도에 미치는 치매 지식의 영향력을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모두 치매 지식이 높은 경우에 치매 태도와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 저학력 자가 많은 치매안심마을의 치매 지식 수준이 일반 마을에 비해 낮았지만, 긍정적인 치매 태도를 가지 는데 치매 지식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성공적인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는 대상자 수준에 맞는 치매 교육과 검증된 정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헬스 리터 러시 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치매 관련 컨텐츠 개발 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