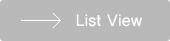Ⅰ. 서론
중재시술 분야에서 치료재료의 선택은 환자 예 후와 직결되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치료재료 채 택 및 사용 패턴은 임상적,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Drug-Eluting Stent (DES), Bare-Metal Stent (BMS),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 Balloon Catheter, 그리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Balloon Catheter는 혈관 개입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심 치료재료로, 국내 보험재정 지출에서도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1][2].
일반적으로 새로운 치료재료는 기존 재료에 비 해 향상된 임상 효과나 시술 편의성을 제공할 때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3]. 반면, 임상적 경쟁 력이 떨어진 기존 제품은 점차 사용이 중단되거나 보험 적용이 축소되며 퇴출 절차를 밟는다[4]. 특히, 이와 같은 경향은 관상동맥중재술에서 사용되는 스 텐트의 발전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BMS는 재협착률을 현저히 감소시켰지만, 시술 후 6~12개월 이내에 15-20%의 환자에게서 스텐트 내 재협착(In-Stent Restenosis, ISR)으로 인한 재혈 관화가 요구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ES가 개발되었으며, 이 는 BMS에 비해 재혈관화율을 약 50에서 70%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DES는 대부 분의 혈관 개입술에서 선호되는 선택지가 되었으 며, 임상 지침에서도 BMS보다 DES의 사용을 점차 권고하는 추세이다[6]. 실제로 국내외 연구 결과, BMS 사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DES는 증가하 는 경향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7]. 그러나 이 러한 전환의 속도와 양상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의 료기관의 규모나 기능, 지역별 접근성, 정책 수용 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8][9]. 한편, 스텐트와 달리 풍선 카테터류(PTA, PTCA)는 특정 대체 관 계보다는 시술 수요 증가와 적용 범위 확대로 인 해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0]. 실제로 풍선 카테터를 사용하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의 시행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 증가하였다[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간 PCI 시술률은 2002년 인구 10만 명당 29.1건에서 2013년 107.7건으로 상승함을 제시하였다[12]. 이러 한 추세는 국내 관상동맥 중재술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풍선 카테터 및 사용 증가 추이를 체계적 으로 감시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존 문헌은 특정 치료재료의 사용 현황이나 기 술의 비용-효과성에 집중해 왔지만[13], 치료재료의 ‘도입–확산–퇴출’이라는 기술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드물다. 이는, 의 료기술의 도입과 확산, 그리고 기존 기술의 퇴출은 단순히 임상적 효용성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기 때 문이다[3]. Rogers의 혁신확산이론은 새로운 기술 이 사회체계 내에서 점진적으로 채택되며, 채택 속 도가 기술의 상대적 이점, 적합성 등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고 본다[14]. 또한 기술수용모델(TAM)은 사용자가 인지한 유용성과 용이성이 채택 결정에 핵심적임을 설명한다[15].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 적 틀을 바탕으로, DES의 빠른 확산과 BMS의 급 속한 퇴출을 한국 의료기관의 제도 및 조직적 맥 락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병원 종별 또는 지역별로 새로운 치료 재 료의 수용성과 기존 재료의 중단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국내 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14년 스텐트 개수 제한 폐 지 및 보험급여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 음에도,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 치료재료의 확산과 퇴출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치료 재료의 생애주기는 임상적 효용성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제도적·정책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전국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대표적인 혈관중재 치료재료인 DES, BMS, PTA Balloon, PTCA Balloon 의 2010년부터 2024년 동안의 청구량 추이를 분석하 고, 특히 스텐트류의 경우, 2014년 전후의 퇴출 양상 을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로, 기관 종별 및 지역별 패턴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의 료기관의 치료재료 채택 및 중단 전략을 계량적으 로 이해하고, 향후 치료재료 급여 정책 및 병원 자 원계획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16].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2010년 부터 2024년까지의 치료재료 청구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한다. 해당 자료는 2010년 이후부터 연속적으 로 구축 및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 기간의 시 작점을 2010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DES, BMS, PTA Balloon, PTCA Balloon의 네 가지 치 료 재료이며, 청구량(건)은 연도, 시도, 기관 종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단위로 집계 하였다.
BMS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된 데이터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일부 시도(울산, 강 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세종)와 의원·병원급 기관의 청구량 자료가 누락되어, 절대적인 사용 규 모는 다소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도별 자료는 2010~2021년에 국한되어 이후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S는 전체적으로 청구량이 극히 적었고, 제공된 12년간의 연속 자료에서 일관된 감소 추세가 관찰 되었기에, 본 연구는 BMS의 ‘퇴출 경향성’에 초점 을 두어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 제약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2. 변수 정의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치료재료의 연도별 청구 건수 를 활용하여 총청구량, 5년 단위의 평균 청구량과 연평균 증가율(CAGR)을 산출하였다. 연평균 증가 율은 기간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평균 성장률로 서, 연도별 단시 변동의 영향을 줄이고 전체 기간 의 평균적 연간 변화 속도를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17]. 이는 기술의 도입-가속-포화로 이어지는 곡선을 단일 지표로 비교하려는 본 연구 의 목적에 적합하며, 서로 다른 치료재료 간 전환 의 속도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연평 균 증가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구하였다.
다음, 시간에 따른 청구량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선형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β 계수를 통해 연도별 청구량의 경향성을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2014년 시행한 스텐트 개수 제한 폐지 및 보험급여 확대 정책을 고려하여, 2014년을 기준으 로 구간별 회귀분석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를 실시하였다 [18]. 해당 정책은 스텐트에 국한된 정책으로서, 풍선 카테터류의 사용에는 직접적 영향 이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정책 효과가 직접적으 로 나타날 스텐트류 (DES, BMS)에 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시행 전후의 청구 수 준 및 추세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시 도 및 기관 종별의 청구량을 시각화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등 지리적·구조적 요인에 따른 이질성을 비교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보건의 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누구나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 대된 데이터로, 모든 개인정보는 사전에 비식별 처 리되어 개인 단위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석은 연도, 시도, 기관 종별 집계 수준에서만 수행되었 으며, 특정 개인 및 기관을 식별하거나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HIRA의 자료 이용 지침을 준수하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본 연구는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없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24S1A5C3A02042563).
Ⅲ. 연구결과
1. 치료재료별 청구량 및 성장 추이
<Table 1>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치료재료 별 청구량과 성장 추이를 요약한 결과이다. 전체 기간 동안 Drug Eluting Stent (DES)는 총 1,380,516건이 청구되어 네 가지 치료재료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용량을 보였고, 연평균 성장률은 3%로 나타났다. Bare-Metal Stent (BMS)는 총 11,380건으로 사용량이 가장 적었고, 연평균 성장 률은–26%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0 –2014년 평균 1,593건에서 2020–2024년에는 211 건으로 약86.7% 감소하여 사용이 중단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Table 1>
Summary of Claims Volume and Growth Trends by Medical Device (2010-2024)
Note. *Compound Annual Growth Rate; The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 was calculated using the full observation period for each device. For DES, PTA balloon, and PTCA balloon, the period 2010–2024 was applied. For BMS, however, data were available only until 2021; thus, the CAGR was calculated based on the period 2010–2021.
| 2010 - 2014 (Cases) | 2015 - 2019 (Cases) | 2020 - 2024 (Cases) | Total Claims Volume (Cases) | CAGR* | |
|---|---|---|---|---|---|
|
|
|||||
| DES | 73,123 | 95,697 | 107,283 | 1,380,516 | 3% |
| BMS | 1,593 | 598 | 211 | 11,380 | -26% |
| PTA Balloon | 25,463 | 42,257 | 71,338 | 695,289 | 12% |
| PTCA Balloon | 328,124 | 491,150 | 690,364 | 1,509,638 | 6% |
PTA Balloon의 경우 총 695,289건이 청구되었 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2%로 네 가지 치료재료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0–2014년 대 비 2020–2024년의 평균 청구량은 약180% 증가하 여 사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TCA Balloon의 청구량은1,509,638건으로, 가장 많 은 총 청구량을 기록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6% 로 나타났다.
DES, PTA Balloon, PTCA Balloon은 모두 사용 량이 뚜렷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PTA Balloon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BMS는 분석 기간에 사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2. 스텐트류 및 풍선 카테터류 치료재료 청구량 의 시간적 추이
스텐트류와 풍선 카테터류 치료재료의 시간 추 이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DES는 β = 3,140.28로 나타났으며, 1년이 지날수록 DES 청구량이 연평균 약3,410건씩 증가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0001). 반면에 BMS의 경우 β = -153.67로, 1년에 지날수록 청구량이 154건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0001). 모형의 설 명력은 DES의 경우 R²=0.8872, BMS의 경우 R²=0.8771로 나타나, 두 모형 모두 높은 설명력이 나타났다.
<Table 2>
Time Trends in Claim Volume for Stent-Type and Balloon Catheter-Type Medical Devices
| DES | BMS | |||||||
| β | SE | t | p-value | β | SE | t | p-value | |
|
|
||||||||
| intercept time | -6786497 | 680210 | -9.98 | <.0001 | 310714 | 32181 | 9.66 | <.0001 |
| 3410.28 | 337.24 | 10.11 | <.0001 | -153.67 | 15.95 | -9.63 | <.0001 | |
| R2= 0.8872 adjR2= 0.8785 | R2= 0.8771 adjR2= 0.8676 | |||||||
|
|
||||||||
| PTA | PTCA | |||||||
| β | SE | t | p-value | β | SE | t | p-value | |
|
|
||||||||
| intercept time | -9555886 | 700784 | -13.64 | <.0001 | -1468255 | 1059179 | -13.86 | <.0001 |
| 6 | ||||||||
| 4760.65 | 347.44 | 13.7 | <.0001 | 7329.3 | 525.12 | 13.96 | <.0001 | |
| R2= 0.9352 adjR2= 0.9303 | R2= 0.9374 adjR2= 0.9326 | |||||||
풍선 카테터류의 경우, PTA Balloon은 β = 4,760.65로, 1년이 지남에 따라 청구량이 약4,761건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TCA Balloon의 경 우, β = 7,329.30로, 1년이 지남에 따라 청구량이 약7,329건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치료재 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01). 모형의 설명력은 PTA Ballon의 경우 R²=0.9352, PTCA Balloon의 경우 R²=0.9374로 나타났다.
3. 스텐트 청구량의 2014년 정책 전후 변화
<Table 4>는 DES와 BMS의 2014년 정책 전후 청구량 추세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DES 의 경우 2014년 이전 연평균 청구 증가량은 β =1,912.20 (p=0.4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2014년 시점에서의 즉각적 변화량은 β =7,162.55 (p=0.39)로 나타났으며, 이후 연평균 청 구 증가량은 β=1,190.39 (p=0.67)로 역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은 R²=0.8959였 다.
<Table 3>
Estimated Annual Trends and Level Changes in Stent-Type Utilization Before and After 2014
| DES | BMS | |||||||
|---|---|---|---|---|---|---|---|---|
| β | SE | t | p-value | β | SE | t | p-value | |
|
|
||||||||
| Annual trend before 2014 | 1912.20 | 2635.37 | 0.73 | 0.48 | -466.30 | 54.76 | -8.51 | <.0001 |
| Immediate change at 2014 | 7162.55 | 7945.94 | 0.90 | 0.39 | 416.27 | 165.12 | 2.52 | 0.03 |
| Annual trend after 2014 | 1190.39 | 2694.60 | 0.44 | 0.67 | 356.26 | 55.99 | 6.36 | <.0001 |
| R2= 0.8959 | adjR2= 0.8675 | R2= 0.9781 | adjR2= 0.9722 | |||||
BMS의 경우, 2014년 이전 연평균 청구량은 β= –466.30 (p<0.0001)으로 유의한 감소 추세를 보였 다. 2014년 시점에서의 즉각적 변화량은 β=416.27 (p=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14년 이후 연평균 청구량 변화는 β=356.26 (p<0.0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를 반영 한 최종 기울기는 β=-110.04로, 여전히 감소 추세 가 지속되었으나 이전보다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R²=0.9781였다.
4. 스텐트 및 풍선 카테터류의 시도 단위 청구 량 변화
<Figure 1>은 4가지 치료재료에 대한 2010년부 터 2024년까지의 시도별 청구량 변화 추이를 나타 낸 것이다. 우선 DES의 경우 대부분 시도에서 청 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과 경 기 지역은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대부분 시도의 청구량이 2022년을 기준으로 빠르 게 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시기별 격차는 다소 유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청구 집 중 현상이 뚜렷했다.
BMS의 전반적 청구량은 모든 시도에서 빠르게 감소하였다. 2010년 기준 서울이 가장 높은 청구량 을 기록했지만, 이후 급격히 줄어들며 2019년부터 는 청구가 사실상 중단되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역시 청구량이 빠르게 감소했으나, 서울보다는 완 만한 속도로 감소하였고, 마지막 조사 연도인 2021 년까지 일부 청구가 지속되었다. 다른 시도들 또한 2014년을 전후해 청구량이 급감했으며, 2017년 이 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청구가 소실되는 추세 를 보였다.
PTA Balloon은 서울, 경기에서 가장 높은 청구 량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으며, 특히 서울과 경기 도는 2010년 대비 2024년 청구량이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였다. 부산은 지속적으로 3번 째에 위치했으며, 부산을 포함한 인천, 대구 등 대 도시 권역의 청구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 으나, 서울·경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비수도 권 시도들 간의 청구량 편차는 완만했으며, 수도권 집중 청구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PTCA Balloon도 PTA Balloon과 비슷하게 수도 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는 2010년 이후 청구량이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경기 도는 2024년에는 서울과 격차를 좁히는 추세를 보 였다. 수도권에 이어 부산도 높은 청구량을 유지했 다. 그 외 다른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2016~2017년 을 기점으로 청구량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었으며, 이전 연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한 상승세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5. 의료기관 종별 스텐트 및 풍선 카테터류 청 구량 경향
각 치료재료의 연도별 청구량 추이를 의료기관 종별로 정리하여 시각화한 결과는 <Figure 2>와 같았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종합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DES 청구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종합병원의 청구량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약 62,000건으로 가장 큰 값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 역시 2010년 대 후반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이후 다소 변동성 있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병원과 의원은 청구량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의미 있는 증가 추 세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2>
Trends in Claim Volume for Stent and Balloon Catheter Devices by Type of Healthcare Institution (2010-2024)
BMS의 종별 청구량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상 급종합병원에서의 감소 속도가 더 가팔랐으며, 2010년에는 종합병원보다 청구량이 많았으나 2016 년을 기점으로 두 기관의 청구량이 역전되었다. 이 후 상급종합병원의 청구량이 종합병원보다 더 낮 게 나타났다.
PTA Balloon의 종별 청구량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들 기관에서 집중된 사용 패턴이 나타났다. 전체 적으로는 2016~2017년을 기점으로 청구량이 증가 했고, 2021~2022년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일시적인 감소를 했다. 의원의 청구량은 2010 년부터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1년 이후 급격히 상 승하여 2022년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청구량을 역전했고, 2025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청 구량을 기록했다. 해당 추세는 PTA Balloon의 화 살표로 표시된 구간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PTCA Balloon의 종별 청구량은 종합병원과 상 급종합병원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두 기관 모두 2016년 이후 급격한 상승을 나타냈으며, 몇 개의 연도를 제외하면 종합병원의 청구량이 상급 종합병원보다 많았다. 병원과 의원은 전 기간에 걸 쳐 청구량이 비교적 낮았으며, 뚜렷한 증가 추세는 관찰되지 않았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최근 15년간 한국의 의료기관들이 스 텐트 및 풍선 카테터를 채택하고 중단하는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중요한 연구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치료재료에 대한 빠른 채택이 관찰 되었다. DES, PTA Balloon, PTCA Balloon은 모두 연도별 청구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PTA Balloon은 연평균 12%의 증가율로 가장 가파 른 확산을 보였다. 이는 한국 의료기관들이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된 치료재료에 대해 비교적 신속하 게 사용을 확대해 왔음을 보여준다 [19].
둘째, 기존 치료재료의 퇴출도 확인되었다. DES 와 비교하면, BMS는 2010년대 초반 이후 급격히 사용이 줄었고, 대부분 시도 및 병원 종별 분석에 서 2020년 이후 청구가 거의 소실되었다. 단순 추 세 분석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임상 지침의 개정, 기술적 대체 가능성, 보험급여 기준의 재조정이 결 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20].
한편, 2014년 전후 구간별 분석에서는 DES가 정책 시행 전후 모두 증가 추세를 유지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BMS 의 경우 정책 이전에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완화되는 양상이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2014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시행 한 정책이 DES 확산을 새롭게 가속화하기 보다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임상적 근거와 지침 변화에 기 반한 확산 경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 다. 동시에, 해당 정책은 특정 임상 상황에서 BMS 사용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제공하여, 급격한 소명 대신 점진적 축소의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1]. 이러한 결과는 의료기술의 확산과 퇴출이 단순한 임상적 효용성만으로 설명되 지 않고, 정책적 조정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다른 속도로 전개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22].
나아가, 본 연구에서 확인된 DES 확산과 BMS 퇴출의 비대칭적 속도는 Rogers의 확산 이론과 기 술수용모델(TAM)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14][15]. DES는 재협착 감소라는 명확한 임상적 이점과 보 험 급여 확대 등 제도적 적합성을 기반으로 빠르 게 확산된 반면, BMS는 상대적 가치가 약화되면서 ‘퇴출(de-adoption)’ 경로에 들어섰다. 이는 의료기 술의 채택과 퇴출이 단순한 임상 근거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조직적 요인과 정책 환 경이 결합해 형성된 결과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 급여 기준 변경과 같은 정 책 변화가 단순히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넘어, 의료기관이 치료 재료를 도입하고 단계적으 로 퇴출시키는 속도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보험 급여 제한 완화는 DES 확산에 구조적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기 술의 도입과 소멸이 단지 임상적 효용성뿐만 아니 라 광범위한 제도적 환경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함 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는 기술의 확산뿐 아니라 저가치 기술의 퇴출(de-adoption) 역시 의료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점점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7].
셋째, 지역 및 기관종별 편차도 뚜렷하게 나타 났다. 수도권(서울, 경기)에서 치료재료 채택이 가 장 빠르고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의원급 의료기 관에서 PTA Balloon 사용이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장비 보급의 확산, 시술 가능 인력의 확대, 외래급여 적용 확대 등 구조적·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의 집중 현상은 의료 인프라의 쏠림뿐 아니라, 고 령화로 인한 시술 수요 증가와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23]. 또한 지방 의료기관의 기술 수용 속도 가 느린 현상은 기존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보고 된 바 있다 [2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BMS 사례는 단순한 사용 감소가 아니라, 한국의 의료기관이 기술 수용 측면에서 매우 빠른 반응을 보이며, 기존 치료재료 에 대한 '선택적 퇴출 전략(selective de-adoption)' 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본 연구는 임상적 근거와 정책적 변화가 동시 에 작용하여, 가치가 낮은 기술은 빠르게 퇴출되 고, 대안 기술인 DES가 급속히 확산되는 과정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는 기준 확산 이론이 주로 ‘채 택 속도’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달리, 본 연구가 확산과 퇴출을 함께 계량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책적 대응 방향에도 시사 점을 제공한다, 우선, 의료기관 및 지역별 치료 재 료 확산과 퇴출 양상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수가 산정 및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성 을 반영한 정밀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다음, 의 원급 의료기관에서의 PTA 풍선 카테터 사용량의 급증은 외래 시술 확산에 따른 안전 관리 및 교육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국내 의료기관의 신의료기술 도입 속도가 실제 임상 결 과 및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 해서는 환자 단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필수적 이다. 마지막으로, 치료재료 활용 추세가 국민건강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추세 가 환자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는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집계 단 위 분석이라는 특성상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연도, 시도, 기관 종별을 중심으로 치료재료 의 청구량을 집계했기 때문에, 환자 단위의 정보는 부족하다. 환자의 나이, 성별, 동반 질환이나 임상 적인 예후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량 변 화의 원인과 임상적 효과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제한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BMS 자료의 불균형 및 결측으 로 인해 비교 해석에 제약이 따른다. 구체적으로, 일부 시도(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세 종)와 의료기관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고, 분석 기간도 2021년까지만 확보되어 다른 치료재료와의 장기적 비교가 제한적이다. Chang et al. [25]의 연 구에 따르면, BMS는 2018년 이후 임상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되어 사용량이 거의 보고되지 않았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해당 기간의 자료 공백 이 설명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상 일 부 연도와 지역의 결측이 존재함에 따라 해석 과 정에서 측정 편향이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BMS와 DES의 장기적 비교 결과는 주 로 2010년~2021년 구간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후 구간에 대한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 후 연구에서는 결측이 없는 범위를 중심으로 한 민감도 분석이나 보완적 방법론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단순선형회귀와 기술통계 중심 으로 추세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통계모형의 단 순성이 한계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에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정책을 중요한 제도적 맥락 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한계로, 정책 변화 가 실제로 DES 확산 및 BMS 퇴출 패턴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 의 중요한 한계점으로, 정책 시행 전후의 구조적 변화나 인과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하지 못했 다는 제약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중차분석 법(DiD)이나, ARIMA 모델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 하여, 정책 변화가 치료재료 사용 추세에 미친 효 과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치료재료 청구량 변화와 재시술률, 합병증 발생률과 같은 실제 환자의 예후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임상적 결과와의 연결 부족은 후속 연구에서 환자 단위 자료 활용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치료재료의 확산과 퇴출을 장기간·전국 단위 자료를 통해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특정 치료재 료의 사용 현황이나 비용-효과성에 머물렀던 한계 를 넘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연구 공백을 보 완하였다 [2]. 스텐트와 풍선 카테터를 함께 분석 하여 치료재료의 ‘도입–확산–퇴출’ 전 과정을 전 국 단위 장기 자료로 제시하였고, 2014년 스텐트 개수 제한 폐지라는 정책 변화와 지역·기관별 이 질성을 반영함으로써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기술 확산과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 었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술의 전환 과정을 체 계적으로 조명하고, 향후 급여 정책과 병원 자원계 획 수립에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의료기관의 치료재료 채택 및 중단 경향을 계량적으로 검토하였다. 새로 운 치료재료인 DES, PTA/PTCA Balloon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기존 치료재료인 BMS는 급속히 사용이 중단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의 료기관의 기능 수준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 며, 기술의 도입과 퇴출이 병원별 전략 및 정책 환 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설정, 신의료기술 평 가, 또는 장비 보급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러한 종 별·지역별 이질성을 반영한 세분된 접근이 필요하 다. 또한, 의원급에서 외래 중재 시술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육체계 강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치료재료 사용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치료재료의 확 산이 임상 성과에 미친 효과도 환자 단위 자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스텐트 개수 제한 폐 지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특정 치료재료의 확산을 단순히 촉진하기보다는 기존 추세를 강화하고, 동 시에 일부 기존 재료의 퇴출 속도를 조정하는 방 식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책 설계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술의 채택과 퇴 출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급여 기준 변경이나 신 의료기술 등재 절차가 치료재료 채택 속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기관 규모·지역 간 격차의 원인 을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