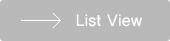Ⅰ. 서론
2019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 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를 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하였고,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그해 4월 누 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초과하였다[1][2]. 2023 년 3월 기준 국내 누적 환자 수는 30,820,130명, 누 적 사망자 수는 34,255명에 달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와 보건당국 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정책 등 대규모 대응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한 2차 여파에 대해 코로나19 심리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 원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2].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경제 위축 및 고용 충격과 저소득층의 더딘 회복력 등 경제적으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이후 1년간 국내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3%p, 민간 소비 증가율 은 7%p 이상 낮아졌고, 고용인구는 약 46만 명 감 소하는 등 고용 충격을 일으켰다[3]. 이와 더불어 2020년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가구소득이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4]. 특히 저소득층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근로 및 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더 크고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측되었다[5][6]. 실제로 팬데믹 이후 서비스 업종의 생산성이 점차 회복되 고 있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7].
한국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그리고 상용직과 자영업자 간의 임금 격차와 고용 안정성 차이가 두드러진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로 되어 있어 코 로나19의 영향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 날 가능성이 크다[8]. 실제로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실직뿐만 아니라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감소를 가장 크게 경험한 집단이었으며,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빈곤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났다[9][10]. 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를 크게 경험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 동자보다 실직, 소득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이 더 컸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히 비전형 노동 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11][12].
한편, 직업군에 따라 업무 환경은 각기 다른 특 성을 보인다. 화이트칼라 직업군(관리직/전문직)은 주로 문서 작업 등 사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업무 장소의 제약이 적고, 원격근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후에도 다 른 직업군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13]. 또한, 화이트칼라 직업군은 기술 변화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분류된다[14]. 반면, 핑크칼라 직업군(판매서비스직)은 감정노동과 대면 서비스가 주요 특징으로, 대면 접촉의 빈도가 높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높은 업무 스트레 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15]. 블루칼라 직업군 (생산직)은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비사무직 직무가 대부분으로, 재택근무가 어렵고 기술 변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에 더 취약하였다[14][16].
이처럼 직업군에 따라 업무 환경과 고용 안정성 이 상이한 특성을 보임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작 업 환경 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상 지위와 직업군별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코로나19 전후 소 득변화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 다. 기존 연구는 주로 특정 계층이나 직업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직업군과 종사상 지위 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취약집단을 구체적 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7][8][10][11][12][17].
따라서 본 연구는 종사상 지위와 직업군을 함께 고려한 직업유형과 코로나19 전후 소득변화의 관 련성을 파악하고 코로나19 전후 소득변화와의 관 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업유형에 따른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취약집단을 파악하 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효율적 인 재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자료원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2021년 지 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 용할 수 있는 지역건강통계 자료로서 표준화된 조 사지표와 수행체계를 통해 수집되고 있다. 표본가 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229,242명을 대 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조사기간은 2021년 8 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다. 총 229,242명 중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 인구 94,301명을 제외하고, 변수 무응답·결측 1,815 명을 추가 제외하여 133,126명을 확보하였다. 직업 유형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귀하는 코로나19 유 행(2020년 1월) 이전과 비교하여 일자리에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설문 문항에 ‘변함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바탕으로 총 97,680명을 포함하였다.
2. 변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코로나19 전후로 가구소득의 변화 여부로 ‘귀 가구는 코로나19 유행(2020년 1월) 이 전과 비교하여 가구의 총 소득에 변화가 있었습니 까?’라는 설문 문항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늘어났 다’와 ‘변함없다’를 ‘감소하지 않음’으로, ‘줄어들었 다’를 ‘감소하였음’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투입하 였다.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독립변수는 직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직업 군 및 종사상 지위로 세분화한 직업유형이다. 지역 사회 건강조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 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 무종사자, 군인으로 분류하였다. 근로자를 중심으 로 분석한 선행연구의 분류를 참고하여 관리자, 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를 ‘화이트칼라 (전문행정관리 및 사무직)’,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를 ‘핑크칼라(판매서비스직)’,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군인을 ‘블루칼라 (농 림어업, 기농단순노무직, 기타)’으로 재분류하였다 [18]. 또한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 임 금근로자로 구분되었으며, 직업군과 종사상 지위를 함께 고려한 직업유형으로 ‘화이트칼라 고용주 및 자영업자’, ‘화이트 칼라 임금근로자’, ‘핑크칼라 고 용주 및 자영업자’, ‘핑크칼라 임금근로자’, ‘블루칼 라 고용주 및 자영업자’, ‘블루칼라 및 임금근로자’ 로 분류하였다[19]. 통제변수는 Nam & Lee[10]와 Lee[20]의 연구를 고려하여 가구소득 또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투입하였다. 이에 인구사회 학적 요인, 경제특성 요인, 가구특성 요인과 질병 또는 장애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 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을, 경제 특성 요인으로는 가구소득을 선정하였다. 연령은 ‘청년층(19~44세)’, ‘중년층(45~64세)’, ‘장년층(65~74 세)’, ‘노년층(75세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교육수 준은 ‘무학’, ‘서당/한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를 ‘고졸 이하’로, ‘2년/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이상’은 ‘대학 재학 이상’으로 재분류 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동’, ‘읍면’으로 분류하여 투입하였으며, 가구 월소득은 백 만원 단위로 재구 성하여 연속형 변수로 분석하였다. 가구특성 요인 으로는 혼인상태와 가구원수를, 질병 또는 장애 요 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가 투입 되었다. 혼인상태는 ‘미혼으로 배우자가 없다’는 ‘미혼’으로, ‘배우자가 있으며, 함께 살고 있다’는 ‘기혼’, ‘배우자 있으나, 함께 살고 있지 않는다’, ‘배우자 사망으로 배우자가 없다’, ‘이혼으로 배우 자가 없다’는 ‘이혼 또는 기타’로 재분류하였다. 가 구유형은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 ‘1인가구’, 그 외 는 ‘다인가구’로 재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 ‘매우 나쁨’은 ‘낮음’으로, ‘보통’은 ‘보통’으 로, ‘좋음’, ‘매우 좋음’은 ‘높음’으로 분류하였다. 만성질환 유무는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 이 있습니까?’와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적 이 있습니까?’라는 설문문항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두 문항 모두‘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없음’으로, 둘 중 하나라도 있을 경우 ‘있음’으로 분류하여 분석 에 투입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복합표본 설계를 기반으로 수집된 지 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제시된 가중 치, 층화변수, 집락변수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 표본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명목형 변수는 빈도 와 가중치가 부여된 백분율을, 연속형 변수는 가중 치가 부여된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을 각각 기술통계량으로 보고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과 코로나19 전후 소득변화 분포에 차이 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명목형 변수는 Rao-Scott 카이제곱 검정을, 연속형 변수는 복합표 본 선형 회귀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직업유형과 코로나19 전후 소득변화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 해 다변수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여 오즈비 (Odds Ratio, OR) 및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tata/MP 15.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로 양측 검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코로나19 전후 소득변화에 따른 일반적 특성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코로나19 전후 소 득변화에 따른 일반적 특성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총 97,680명의 연구대상자 중 27.3%가 코로 나19 전후 소득감소를 경험하였다. 직업유형의 경 우 전체 연구대상자 중 화이트칼라 고용주 및 자 영업자는 5.1%, 화이트칼라 임금근로자 44.4%, 핑 크칼라 고용주 및 자영업자 4.9%, 핑크칼라 임금근 로자 12.3%, 블루칼라 고용주 및 자영업자 7.6%, 블루칼라 임금근로자는 25.7%이었다. 코로나19 전 후로 소득감소를 경험한 핑크칼라 고용주 및 자영 업자는 57.5%로 소득감소를 경험할 비율이 가장 높았다(X2=473.35, p<0.001). 성별의 경우 전체 연 구대상자 중 남성은 59.1%를, 여성은 40.9%를 차 지하였다. 소득감소군에서 여성이 28.6%, 남성은 26.4%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X2=41.29, p<0.001). 연령의 경우 전체 대상자 중 청년층이 47.7%, 중년층 42.7%, 장년층 6.9%, 노년 층 2.7%을 차지하였다. 이중 소득감소를 경험한 장 년층은 30.0%, 중년층 29.7%, 청년층 25.2%, 노년 층 18.7%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78.82, p<0.001). 교육수준은 전체 연구대상자 중 고등학 교 졸업 이하가 43.2%, 대학교 졸업 이상이 56.8% 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33.1%)가 대학교 졸업 이상(22.9%)보다 소득감소를 경험할 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났다(X2=585.01, p<0.001). 혼인상태의 경우 전체 연구대상자 중 미혼이 65.1%으로 가장 많았 으며, 기혼 24.8%, 이혼 또는 기타는 10.1%이었다. 소득감소를 경험한 기혼자는 29.0%, 미혼자는 27.0%, 이혼 또는 기타는 25.0%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X2=16.79, p<0.001). 가구유형의 경우 전 체 연구대상자 중 다인가구가 86.5%, 1인가구는 13.5%를 차지하였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감소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다인가구가 소득감소를 경험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다인가구: 29.1%, 1인가구: 15.7%, X2=568.98, p<0.001). 가구 월소득의 경우 평균 5.1백만원(±3.2)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 우 동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81.0%으로 가장 많았 으며, 읍면 거주자는 19.0%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역에 따른 소득감소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X2=0.03, p=0.860).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좋음’이 51.4%, ‘보통’이 42.3%, ‘나쁨’은 6.3%이었 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소득감소를 경험 할 비율이 높아졌다(좋음: 26.7%, 보통: 27.8%, 나 쁨: 29.2%, X2=7.62, p<0.001). 전체 연구대상자 중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가 79.7%, 있는 경우는 20.3%이었다.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소득감소 경험 률이 높아졌다(있음: 28.6%, 없음: 27.0%, X2=12.18, p<0.001)<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income change after COVID-19
n=unweighted sample size; r%=weighted row %; c%=weighted column %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t-statistics
| Variables | Income Change After COVID-19 | Total(n=97,680) | X2 (p-value) | |||||
|---|---|---|---|---|---|---|---|---|
| Income Increase or No Change(n=71,252 | Income Reduction (n=26,428) | |||||||
|
|
||||||||
| n | r% | n | r% | n | c% | |||
|
|
||||||||
| Job Type | White-collar employer and self-employed | 2,296 | 59.8 | 1,626 | 40.2 | 3,922 | 5.1 | 473.35 (<0.001) |
| White-collar Wage & Salary worker | 26,123 | 80.3 | 6,352 | 19.7 | 32,475 | 44.4 | ||
| Pink-collar employer and self-employed | 2,070 | 42.5 | 3,111 | 57.5 | 5,181 | 4.9 | ||
| Pink-collar Wage & Salary worker | 7,882 | 68.5 | 3,446 | 31.5 | 11,328 | 12.3 | ||
| Blue-collar employer and self-employed | 12,017 | 62.9 | 5,132 | 37.1 | 17,149 | 7.6 | ||
| Blue-collar Wage & Salary worker | 20,864 | 72.8 | 6,761 | 27.2 | 27,625 | 25.7 | ||
|
|
||||||||
| Sex | Male | 39,748 | 73.6 | 14,469 | 26.4 | 54,217 | 59.1 | 41.29 (<0.001) |
| Female | 31,504 | 71.4 | 11,959 | 28.6 | 43,463 | 40.9 | ||
|
|
||||||||
| Age | 19~44 years | 25,333 | 74.8 | 8,682 | 25.2 | 34,015 | 47.7 | 78.82 (<0.001) |
| 45~64 years | 29,823 | 70.3 | 13,082 | 29.7 | 42,905 | 42.7 | ||
| 65-74 years | 9,645 | 70.0 | 3,476 | 30.0 | 13,121 | 6.9 | ||
| 75 years and above | 6,451 | 81.3 | 1,188 | 18.7 | 7,639 | 2.7 | ||
|
|
||||||||
| Educational level | ≤High school graduate | 38,506 | 66.9 | 16,451 | 33.1 | 54,957 | 43.2 | 585.01 (<0.001) |
| ≥University graduate | 32,746 | 77.1 | 9,977 | 22.9 | 42,723 | 56.8 | ||
|
|
||||||||
| Marital status | Single | 47,002 | 73.0 | 17,974 | 27.0 | 64,976 | 65.1 | 16.79 (<0.001) |
| Married | 12,675 | 71.0 | 5,080 | 29.0 | 17,755 | 24.8 | ||
| Divorced or other | 11,575 | 75.0 | 3,374 | 25.0 | 14,949 | 10.2 | ||
|
|
||||||||
| Household type | One-person | 13,063 | 84.4 | 2,565 | 15.7 | 15,628 | 13.5 | 568.98 (<0.001) |
| Multi-person | 58,189 | 70.9 | 23,863 | 29.1 | 82,052 | 86.5 | ||
|
|
||||||||
| Household monthly income* | 5.2 | 3.3 | 4.7 | 2.9 | 5.1 | 3.2 | 15.23† | |
| (<0.001) | ||||||||
|
|
||||||||
| Residential area | Urban | 38,758 | 72.7 | 15,138 | 27.3 | 53,896 | 81.0 | 0.03 (0.860) |
| Rural | 32,494 | 72.6 | 11,290 | 27.4 | 43,784 | 19.0 | ||
|
|
||||||||
| Self-rated Health | Good | 33,648 | 73.3 | 12,181 | 26.7 | 45,829 | 51.4 | 7.62 (<0.001) |
| Fair | 30,573 | 72.2 | 11,774 | 27.8 | 42,347 | 42.4 | ||
| Poor | 7,031 | 70.8 | 2,473 | 29.2 | 9,504 | 6.3 | ||
|
|
||||||||
| Chronic Disease | No | 51,175 | 73.0 | 19,129 | 27.0 | 70,304 | 79.7 | 12.18 (<0.001) |
| Yes | 20,077 | 71.4 | 7,299 | 28.6 | 27,376 | 20.3 | ||
2. 직업유형과 코로나19 전후 소득변화의 관련 성
다변수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 과, 화이트칼라 직업군 고용주 및 자영업자 대비 화이트칼라 임금근로자(OR=0.317, p<0.001, 95% CI=0.289 to 0.347), 핑크칼라 임금근로자 (OR=0.470, p<0.001, 95% CI=0.424 to 0.522), 블루 칼라 고용주 및 자영업자(OR=0.767, p<0.001, 95% CI=0.687 to 0.858), 블루칼라 임금근로자 (OR=0.423, p<0.001, 95% CI=0.384 to 0.467)는 코 로나19 이후 가구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작았다. 한편, 핑크칼라 고용주 및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 후 가구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OR=1.695, p<0.001, 95% CI=1.498 to 1.917). 남 성 대비 여성(OR=1.156, p<0.001, 95% CI=1.112 to 1.203)이, 청년층 대비 중년층(OR=1.175, p<0.001, 95% CI=1.111 to 1.241), 미혼 대비 기혼(OR=1.788, p<0.001, 95% CI=1.671 to 1.913), 1인가구 대비 다 인가구(OR=3.337, p<0.001, 95% CI=3.083 to 3.613) 일수록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이 감소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 대비 장년층 (OR=0.861, p<0.001, 95% CI=0.787 to 0.943), 노년 층(OR=0.460, p<0.001, 95% CI=0.404 to 0.523)은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작았 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대비 대학 졸업 이 상 학력자(OR=0.746, p<0.001, 95% CI=0.709 to 0.786)는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 가능성이 작았다. 거주 지역에서는 동 지역 거주자보다 읍/면 지역 거주자(OR=0.818, p<0.001, 95% CI=0.771 to 0.867) 가 소득감소 가능성이 작았으며, 코로나19 이후 소 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가구 월소득의 백만 원 증 가당 8.2% 작아지는 것(OR=0.918, p<0.001, 95% CI=0.908 to 0.929)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Association between job types and income change after COVID-19
* Ref: Referenc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Incremental per 1,000,000 KRW
| Variable | OR | p-value | 95% CI | ||
|---|---|---|---|---|---|
| LL | UL | ||||
|
|
|||||
| Job Type | White-collar employer and self-employed | Ref | |||
| White-collar Wage & Salary worker | 0.317 | <0.001 | 0.289 | 0.347 | |
| Pink-collar employer and self-employed | 1.695 | <0.001 | 1.498 | 1.917 | |
| Pink-collar Wage & Salary worker | 0.47 | <0.001 | 0.424 | 0.522 | |
| blue-collar employer and self-employed | 0.767 | <0.001 | 0.687 | 0.858 | |
| Blue-collar Wage & Salary worker | 0.423 | <0.001 | 0.384 | 0.467 | |
|
|
|||||
| Sex | Male | Ref | |||
| Female | 1.156 | <0.001 | 1.112 | 1.203 | |
|
|
|||||
| Age | 19~44 years | Ref | <0.001 | 1.111 | 1.241 |
| 45~64 years | 1.175 | ||||
| 65~74 years | 0.861 | <0.001 | 0.787 | 0.943 | |
| 75 years and above | 0.46 | <0.001 | 0.404 | 0.523 | |
|
|
|||||
| Marital status | Single | Ref | <0.001 | 1.671 | 1.913 |
| Married | 1.788 | ||||
| Divorced or other | 1.075 | 0.05 | 1 | 1.155 | |
|
|
|||||
| Educational level | High school or less | Ref | |||
| College or higher | 0.746 | <0.001 | 0.708 | 0.786 | |
|
|
|||||
| Household type | One-person | Ref | |||
| Multi-person | 3.337 | <0.001 | 3.083 | 3.613 | |
|
|
|||||
| Household income† | month continuous | 0.918 | <0.001 | 0.908 | 0.929 |
|
|
|||||
| Residential area | Urban | Ref | |||
| Rural | 0.818 | <0.001 | 0.771 | 0.867 | |
|
|
|||||
| Self-rated health status | Good | Ref | |||
| Fair | 1.022 | 0.319 | 0.979 | 1.066 | |
| Poor | 1.063 | 0.142 | 0.98 | 1.153 | |
|
|
|||||
| Chronic disease | No | Ref | |||
| Yes | 1.016 | 0.562 | 0.964 | 1.07 | |
Ⅳ. 고찰
본 연구는 직업유형에 따른 코로나19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취약집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난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전 국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업유형과 코로나19 전후 소득감소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 구결과, 핑크칼라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감소 가능성이 가장 컸다. 한편, 화 이트칼라 및 블루칼라 고용주 및 자영업자, 핑크칼 라 임금근로자, 블루칼라 임금근로자, 화이트칼라 임금근로자는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대면 접촉을 요하는 서비스직은 코 로나19로 인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실업 위험에 크 게 노출될 가능성이 컸으며, 이를 통해 핑크칼라의 코로나19 경제적 여파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 특히 핑크칼라에 속하는 서비스ㆍ판매 종사 자는 소득 변동에 있어 가장 취약하며, 이는 소비 자와의 대면 서비스 비중이 큰 직업군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10]. 또한, 자영업자의 경 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휴ㆍ폐업으로 소 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행업, 예 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이 코로 나19 이전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21]. 대면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매출 타격이 경영상황 악화와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선 행연구결과는 핑크칼라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가 장 취약했음을 설명할 수 있다[21][22]. 한편, 임금 노동자는 실직이나 근로시간의 감소가 소득감소의 주된 이유로 보고되었다[23].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로 인한 여성 취업자 감소 폭은 판매직, 서비스직, 전문직 순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 매직의 경우 2020년 4월 이후 다소 완화되었으나 숙박ㆍ음식점업과 같은 서비스직의 경우 감소 폭 이 더 커진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이처럼 대면접 촉 기반 산업에 집중된 여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 기존 성별화된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성별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취약집단을 보다 면 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화이트칼라 임 금근로자의 가구소득 감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화이트칼라에는 일정 교육수준 이상이 요 구되는 직종인 전문행정관리, 사무직 직종이 포함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률이 고학력층인 경우 이전의 고용상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 학력층의 경우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컸다는 선행연 구 결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16].
연령의 경우, 청년층 대비 중년층의 소득변화가 큰 것은 중년층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집단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11]. 특히 월세 및 공과금 연체, 불균형한 식사 경험 등의 경제적 어 려움은 해당 연령 집단에서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 주력 인구가 소득감 소를 경험한 것과 대조적으로 노년층의 소득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 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시장소득은 전년 대비 2020년에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19 기간 동안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였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의 맞벌이 비중이 확대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23]. 또 한,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는 코로나19 전후 소득감 소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팬데믹 시기 학교나 보육시설의 폐쇄로 인한 돌봄공백이 부모에게 전 가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코로나 19 발생 이후 주간 근로시간이 약 11% 감소하였으 며, 고용률 또한 3.9%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이는 기혼자의 소득감소가 돌봄체계, 노동시 장 제약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을 시사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비 대학 교 졸업 이상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작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개인의 노동시 장 내 위치와 고용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25]. 특히 고학력자일 수록 고용의 안정성이 높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 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커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 받을 가능성이 크다[26]. 또한, 가구소득이 증가할 수록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작다는 연구결과도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피해 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소득, 직업, 고용 안정성 등의 사회경제적 요 인 측면에서 더 큰 취약성을 보인 집단의 경우, 그 이후에도 경제적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27]. 거주지역과 관련하여 동 지역 거주자 대비 읍면 지역 거주자일수록 코로나19 이 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작았다. 읍면 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동 지역에 비해 낮기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8]. 이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영향이 읍면 지역에서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가 구유형의 경우 1인가구 대비 다인가구일수록 코로 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코로나19로 인 한 가구소득 감소 위험이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1]. 가구 규모가 증가할수록 가 구 내 실직 확률이 4.1%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29]. 한편, 1인 가구, 부부 가구, 한부모 가구 등 가구형태로 구분한 경우, 1인가구 와 한부모 가구의 가구소득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는 연구결과도 함께 보고되었다[11]. 1인 및 한부 모 가구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 원이 적어 충격 완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30]. 이는 가구유형이 부양부담과 소득원 수의 구조적 차이를 더 잘 반 영한다는 점을 시사하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가구 구성 형태와 부양 구조에 따른 차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종사상의 지위를 고용 주 및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에서 더 세분화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가구소득 변수 활용 및 세분화된 종사상의 지위를 고려한 추가적인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 사의 횡단면적 자료원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코로 나19 전후 가구소득 비교를 통한 구체적인 변화 금액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당 설문 문항 이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만을 파악하고 있어, 실제 소득변화의 규 모나 방향을 정밀하게 분석 및 인과관계를 파악하 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2020년 1월 이전과 비교 하였을 때 일자리에 변화가 없는 대상자들만 고려 하였으므로 실업이나 이직한 집단의 소득변화는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실직자 혹은 이직자도 포함하여 전반적 인 소득변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 대규모 데이 터를 활용하여 직업유형과 코로나19 전후 소득변 화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경 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19로 인 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집단에게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직업 유형과 코로나19 전후 소득감소 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직업군 과 종사상 지위를 함께 고려했을 때, 핑크칼라 고 용주 및 자영업자의 취약성이 가장 높은 반면, 화 이트칼라 임금근로자의 코로나19 전후 소득변화 취약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대면 접촉 을 요하는 서비스직은 코로나19로 인한 작업환경 의 변화로 실업 위험에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 경제적 여파도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와 휴ㆍ폐업으로 소득 이 감소하였고, 이는 경영상황 악화와 빈곤으로 이 어졌다. 반면, 화이트칼라 임금근로자에는 일정 교 육수준 이상이 요구되는 직종이 포함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률에 대해 회복탄력성이 높다. 또 한, 여성이 많이 분포된 직업군이 더 많은 실직율 을 보이며 성별화된 이중노동시장구조와 성별 불 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ㆍ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 나19가 종식된 지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여전히 서비스 업종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 고 생산성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직업유형별 회복탄력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바탕으로 단순한 보편적 지원을 넘어 직업유 형별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 지원 정책마련 이 요구된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핑크칼라 고 용주 및 자영업자와 여성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맞 춤형 보호 대책과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