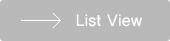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산업사회에서 근로자의 건강은 단순히 질 병의 유무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노동 유연화의 흐름 속에서, 24시간 운영이 필수적인 산업군에서는 교대근무 형태가 불가피하 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1][2][3]. 교 대근무는 일반적인 주간 근무와 달리 일정하고 안 정적인 수면 리듬 확보가 어렵고, 야간 근무는 생 체시계와 멜라토닌 분비 주기를 교란시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1]. 이 러한 수면의 양적·질적 저하는 장기적으로 피로 누적, 면역 기능 저하, 인지 능력 감퇴, 정서 불안 정성 등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심리·사회 적 건강과 주관적 안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2][5].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 다[4]. 이러한 포괄적 건강 개념에 따라, 최근에는 삶의 질, 행복감, 감정적 균형 등을 포함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심리·사회적 지표로 강조되고 있다[6][7].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느끼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 긍 정적 감정의 빈도, 스트레스 수준, 정서적 균형 등 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개인의 정서적 복지 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 수행에도 밀접한 영향을 준다. 특히 수면의 질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연관 성은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충분하고 질 높은 수면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성과 스트레스 회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8][9][10].
교대근무자는 야간 각성, 낮 시간 수면 등 생체 리듬과 맞지 않는 수면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경험 하게 되며, 이는 불면, 반복적인 수면 중 각성, 낮 동안의 졸림 등 다양한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 다. 실제로 교대 근무자들은 일반 근무자에 비해 수면의 질이 낮고, 수면장애 발생 빈도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1]. 이와 같은 수면장애 는 단지 피로의 문제를 넘어, 직무 수행능력 저하, 집중력 부족, 사고 발생률 증가, 나아가 정서 조절 능력 감소와 대인관계 갈등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동반한다[10]. 더욱이 수면의 질 저하는 일상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저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9]. 결과적으로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장애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저 하라는 정서적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8].
이와 관련해 국내의 일부 연구에서는 교대근무 가 수면장애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며, 수면의 질과 주관적 안녕감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 고 있다[11][12]. 그러나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교 대근무와 수면장애, 혹은 수면장애와 주관적 안녕 감 간의 이분법적인 상관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려 는 시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산업구조 와 노동 환경을 반영한 대규모 국가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교대근무와 수면장애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교대근무라는 구조적 요인 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함으로써, 향후 건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7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의 2차 자료 를 활용하여, 교대근무 형태가 주관적 안녕감 수준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주관적 안녕감 이 근로자의 수면장애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규명 하고자 한다. 즉, 교대근무, 수면장애, 주관적 안녕 감 간의 단순한 상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 경로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 함으로써 학문적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대근무 형태가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 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구 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교대근무 형태, 주관적 안녕감 및 수면장애 수준을 파악한다.
-
2) 교대근무 형태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 장애의 차이를 분석한다.
-
3)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입 력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
4) 교대근무 형태와 수면장애와의 관계에서 주 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근로자의 교대근무 형태, 주관적 안 녕감, 수면장애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로, 횡단적 단면조사(cross-sectional survey design)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제7차 근로환경조사(KWCS) 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근무형태에 따른 수면장 애의 차이와 주관적 안녕감이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KOSHA)에 서 수행한 제7차 근로환경조사(2023)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13]. 해당 조사는 대한민국 전국의 만 1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규모 표본조사로, 다단계 층화집락 확률표본추출 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총 50,19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러나 15세 이 상 20세 미만의 근로자는 대부분 고등학생 이하로, 이들의 발달적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수면장애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의 임금근로자(wage workers) 중 교대근무를 한다고 설문 응답이 완료된 2,975명 중, 수면장애와 안녕 감에 결측치가 있는 대상자를 제외시켜, 최종 2,75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제7차 근로환경조사의 응답자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 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만 나이를 연속변수 로 처리하였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혼인상태는 ‘결혼함’과 ‘결혼 안함’으로, 자녀 유무는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2) 교대근무 형태
대상자의 교대근무형태는 하루 단위 분할 교대, 고정 교대, 순환교대로 분류하였으며, ‘기타’ 및 ‘모 름/무응답’ 항목은 결측 처리하였다. 하루 단위 분 할 교대는 1일 안에서 최소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근무 시간이 반복적으로 교대되는 형태를 의 미한다. 고정 교대는 오전, 오후, 야간 등 시간대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순환교대는 오전, 오후, 야간 근무를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교체하 는 형태이다.
3)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KWCS의 5개 문항 ‘나는 즐겁 고 기분이 좋다’, ‘나는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하다’, ‘나는 적극적이고 활기차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면 상쾌하고 푹 쉬었다는 느낌이 든다’와 ‘나의 일 상은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지난 2주 동안의 경험 빈도를 6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항상 그랬다’가 1점, ‘그 런적 없다’가 6점으로 부여되어 역코딩 후 사용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음 을 나타낸다. 모름/무응답과 거절은 결측 처리하 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요인적 재량은 .50 이상이었으며, KMO 값은 .90으로 매우 양호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미하였 다(p<.001). Cronbach’s α 계수는 .85로 높은 신뢰 도를 보였다.
4) 수면장애
수면장애는 KWCS의 3개 문항 ‘잠들기가 어렵 다’, ‘자는 동안 자주 깬다’와 ‘자고 일어나도 지치고 피곤하다’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지난 1년 동안의 경험 빈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매일’ 이 1점, ‘전혀 없음’이 5점으로 부여되어 역코딩 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장애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모름/무응답, 거절은 결측 처리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값은 .74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χ² = 82,955.32 (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누 적 설명력은 81%였으며,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계수는 .88로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교대근무 형태, 주관적 안녕감, 수면장애는 빈도, 백분율,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대근무 형 태에 따른 수면장애는 Independent samples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ANOVA에 대한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대근무 형태가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입력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교대근무 형태와 수면장애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들을 더미 변수화하여 공변량으로 두 고 PROCESS Macro의 Model 4로 분석하였다[14].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통계법 제 18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공단에서 수집하여 연구자에게 제공된 이차자료를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외되어 있다. 본 연구는 대상자 의 권리와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Y 대학교 기관생 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서 심의면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교대근무 형태, 주관적 안녕감 과 수면장애
대상자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성이 55.3%(1,644명), 여성이 44.7%(1,331명)로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60세 이상이 35.1%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대(27.6%), 40대 (16.6%), 30대(14.8%), 20대(5.9%) 순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 상은 28.9%, 전문대 졸업은 20.5%, 중학교 졸업은 5.4%, 초등학교 이하 학력은 1.3%였다. 결혼 여부 는 기혼자가 74.7%(2,184명), 비혼자는 25.3%(741명) 였다. 자녀 유무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65.2%(1,926 명), 없는 경우는 34.8%(1,030명)로 나타났다. 교대 근무 유형은 고정 교대 근무자가 41.3%(1,137명)로 가장 많았고, 순환 교대는 36.9%(1,018명), 하루 단 위 분할 교대는 21.8%(601명)였다.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은 3.91±1.05점, 수면장애의 평균은 1.76±0.76점 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Shift type, Subjective Well-being, and Sleep Disturbance (N=2,756)
N=number, M=mean, SD=standard deviation
| Characteristics | N or M | % or SD | |
|---|---|---|---|
|
|
|||
| Gender | Male | 1,644 | 55.3 |
| Female | 1,331 | 44.7 | |
|
|
|||
| Age (yr) | 20-29 | 176 | 5.9 |
| 30-39 | 441 | 14.8 | |
| 40-49 | 492 | 16.6 | |
| 50-59 | 822 | 27.6 | |
| 60≤ | 1,044 | 35.1 | |
|
|
|||
| Education | No schooling or primary education only | 40 | 1.3 |
| Middle school | 161 | 5.4 | |
| High school | 1,301 | 43.8 | |
| Associate degree | 609 | 20.5 | |
| Bachelor’s degree or higher | 861 | 28.9 | |
|
|
|||
| Marriage | Yes | 2,184 | 74.7 |
| No | 741 | 25.3 | |
|
|
|||
| Children | Yes | 1,926 | 65.2 |
| No | 1,030 | 34.8 | |
|
|
|||
| Shift type | Daily split shifts | 601 | 21.8 |
| Permanent shifts | 1,137 | 41.3 | |
| Rotating shift | 1,018 | 36.9 | |
|
|
|||
| Subjective well-being | 3.91 | 1.05 | |
|
|
|||
| Sleep disturbance | 1.76 | 0.76 | |
2. 일반적 특성과 교대근무 형태에 따른 수면장애
수면장애 수준은 연령, 학력, 결혼 여부, 자녀 유무, 교대근무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연령에서는 20대가 가장 낮은 수면장애가 있었 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면장애 수준이 유의하 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p<.001). 학력에 따 라서는 중학교 졸업자에서 수면장애 수준이 높았 고, 대졸 이상 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p=.002). 결혼 여부에 따라 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수면장애 점수가 유의 하게 높았고(p<.001),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 가 없는 경우보다 수면장애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 다(p<.001). 교대근무 형태에 따라서는 고정 교대 근무자의 수면장애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분할 교 대 근무자는 가장 높았다. 순환 교대는 고정 교대 보다 수면장애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성별에 따른 수면장애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516)<Table 2>.
<Table 2>
Sleep Disturb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hift Type
M=mean, SD=standard deviation
| Characteristics | M (±SD) | t or F | p | Post-hoc (Sheffé) | |
|---|---|---|---|---|---|
|
|
|||||
| Gender | Male | 1.76 (±0.75) | -0.65 | .516 | |
| Female | 1.77 (±0.78) | ||||
|
|
|||||
| Age (yr) | 20-29a | 1.44 (±0.70) | 14.76 | <.001 | a<b,c,d,e |
| 30-39b | 1.65 (±0.80) | b<d,e | |||
| 40-49c | 1.75 (±0.76) | ||||
| 50-59d | 1.79 (±0.78) | ||||
| 60≤ e | 1.85 (±0.73) | ||||
|
|
|||||
| Education | No schooling or primary education onlya) | 2.00 (±0.89) | 4.26 | .002 | b>e |
| Middle schoolb | 1.94 (±0.74) | ||||
| High schoolc | 1.77 (±0.74) | ||||
| Associate degreed | 1.76 (±0.78) | ||||
| Bachelor’s degree or highere | 1.71 (±0.77) | ||||
|
|
|||||
| Marriage | Yes | 1.83 (±0.76) | 8.74 | <.001 | |
| No | 1.55 (±0.73) | ||||
|
|
|||||
| Children | Yes | 1.85 (±0.76) | 8.60 | <.001 | |
| No | 1.60 (±0.74) | ||||
|
|
|||||
| Shift type | Daily split shiftsa | 1.83 (±0.78) | 7.00 | <.001 | a,c>b |
| Permanent shiftsb | 1.70 (±0.76) | ||||
| Rotating shiftc | 1.79 (±0.76) | ||||
3. 수면장애의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수면장애는 기혼자의 경우 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수면장애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분할 교대근무자는 고정 교대근무 자에 비해 수면장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을수록 수면장애는 유 의하게 낮았다. 한편, 연령과 학력 변수는 초기 분 석에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제기되어, 연령은 50세 에서 59세와 60세 이상을 50세 이상으로,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 졸업, 중졸, 고졸을 ‘고졸 이하’로, 그 이상을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더미화하여 재분석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결과 50세 이상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수면장애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영향 요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Factors Affecting Sleep Disturbance
Tol=tolerance,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s
Reference group=age*20∼29, education*≤high school, marriage*yes, children*yes, shift type*daily split shift
| Variables | Β | SE | β | t | p | Tol | VIF |
|---|---|---|---|---|---|---|---|
|
|
|||||||
| (Constant) | 2.23 | 0.09 | 24.30 | <.001 | |||
| Age*30∼39 | 0.14 | 0.07 | 0.07 | 1.93 | .053 | .31 | 3.23 |
| Age*40∼49 | 0.13 | 0.07 | 0.06 | 1.73 | .083 | .27 | 3.67 |
| Age*50≤ | 0.20 | 0.07 | 0.13 | 2.96 | .003 | .19 | 5.18 |
| Education*≥ associate degree | 0.02 | 0.03 | 0.01 | 0.49 | .623 | .85 | 1.17 |
| Marriage*no | -0.12 | 0.05 | -0.07 | -2.21 | .027 | .39 | 2.77 |
| Children*no | -0.12 | 0.05 | -0.08 | -2.42 | .016 | .36 | 2.77 |
| Shift type*permanent shift | -0.09 | 0.04 | -0.06 | -2.38 | .017 | .57 | 1.75 |
| Shift type*rotating shift | -0.01 | 0.04 | -0.01 | -0.26 | .796 | .57 | 1.75 |
| Subjective well-being | -0.13 | 0.01 | -0.18 | -9.83 | <.001 | .99 | 1.01 |
|
|
|||||||
| F(p)=12.30 (<.001), Adjusted R2=.07, Durbin-Watson=1.48 | |||||||
4. 주관적 안녕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교대근무 형태가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고정 교 대근무(B=-0.01, BootSE=.01, 95% CI [-0.01, 0.02]) 및 순환 교대근무(B=-0.00, BootSE=0.01, 95% CI [-0.01, 0.01]) 모두에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Indirect Effects of Shift Type on Sleep Disturbance via Subjective Well-being
* Bootstrap samples=5,000, BootSE=bootstrapped standard error, BootLLCI=bootstrapped lower limit of the confidence interval
BootULCI=bootstrapped upper limit of the confidence interval
Reference group=daily split shift
| Shift type | Indirect Effect | BootSE | 95% Cl | |
|---|---|---|---|---|
| BootLLCI | BootULCI | |||
| Permanent shift | -0.01 | 0.01 | -0.01 | 0.02 |
| Rotating shift | -0.00 | 0.01 | -0.01 | 0.01 |
Ⅳ. 고찰
본 연구는 교대근무 형태가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가 지는 매개효과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대근무 형태에 따라 수면장애 수준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주관적 안녕감은 수 면장애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대근무라는 외재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인 주관적 안녕감, 그리고 건강지표인 수면장애 간의 관계를 탐색했 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안녕감이 근무 형태의 영 향을 충분히 매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가 수 면장애에 미치는 설명력이 7% 수준으로 비교적 낮 게 나타난 점은, 결과 해석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제한점과도 연결된다. 더불어, 일반적 특성에서 60 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전체의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연령과 수면장애 간의 생리적·노화적 관련성이 교대근무 효과보다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표본의 연령 분포는 본 연구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한계라 사료된다.
교대근무 형태별 분석에서는, 고정 교대자가 가 장 낮은 수면장애를 보였고, 분할 교대자는 가장 높은 수면장애가 나타났다. 이는 고정된 수면과 각 성 주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일수록 생체 리듬이 교란되고, 수면의 질과 회복력이 저하된다 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1][15]. 특히 분할 교대는 하루 단위로 근무 시간대가 반복적으로 변경되어 수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이 는 낮 동안의 졸림, 피로감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16].
또한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다른 연령군에 비해 수면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혼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통계 수준 에서는 수면장애 점수가 더 높았으나, 회귀분석 결 과에서는 오히려 B값이 음수로 나타나 수면장애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단순한 평균 차 원에서는 가정 내 역할 부담이 수면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변수를 통제한 회귀모 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가 심리적 안정감 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수면장애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는 국민건강영양조사 7기 자료에서 비결혼군의 수 면장애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17]. 또한 노화에 따른 멜라토닌 분비 감소와 생리적 수면 구조 변화가 고령 근로 자 수면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생리학적 노화 이론 역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16].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수면장애와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귀분석에서도 유의한 부정적 예측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주관적 안 녕감이 높은 근로자는 스트레스 회복력이 크고 주 관적 안정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수면 중 각 성 빈도가 적고 수면 지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을 보여준다[18][19].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불면 증상이 감소하고, 수면 만 족도는 높아지는 것이 보고된 바 있어 본 연구 결 과를 지지하고 있다[20].
그러나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효과 분 석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이 교대근무 형태와 수면 장애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지 못하였다. 이 는 교대근무라는 구조적 노동 조건의 물리적 특성 이 심리·사회적 요인인 주관적 안녕감의 완충 효 과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21]. 예컨데, 근 무 시간대의 급격한 변경이나 회복 수면 부족과 같은 교대근무의 본질적 특성은 개인의 심리적 자 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교대근무와 수면장애, 그리고 안 녕감 간의 관계를 개별적 또는 이분법적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다. 즉, 교대근무가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지지나 우울이 수면의 질을 조절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22][23][24].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교대근무 형태, 주관적 안녕감, 수면 장애라는 세 변인을 동시에 구조적 경로로 분석하 였으며, 그 결과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한 매개효과 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대근 무의 영향이 단순한 심리적 요인으로는 충분히 설 명되지 않으며, 노동 조건이라는 구조적 요인의 개 선이 필수적임을 학문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 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연령과 학력 변수를 더 미화(dummy coding)하고 재범주화(re-categorization)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표본 내 각 범주의 수 적 균형을 맞추고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 법론적 장점이 있으나, 연구자의 판단에 따른 자의적 기준 설정이라는 한계 역시 수반한다. 따라서 본 연 구 결과는 특정 연령·학력 범주에 대한 일반화 가 능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 해석 시 고려 해야 할 중요한 학문적 제약점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적 의의 를 가진다. 첫째, 교대근무 형태가 수면장애에 미 치는 직접적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근무 스케쥴 조 정이나 분할 교대 최소화 등 조직적 차원의 정책 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주관적 안녕감 은 수면장애에 대한 직접적 완충 요인임이 확인되 었으나, 근무 형태의 영향을 매개하지 못했다는 점 에서,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개인의 안녕 증진 프 로그램을 병행하는 이중적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기존 연구와 달리 교대근무·안녕감·수면장애를 동 시에 고려한 구조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심리적 자원의 역할과 그 한계를 학문적으로 규명하였다. 넷째, 향후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뿐 아니라 수면 시간, 회복 시간, 사회적 지지, 직무요구도 등 다양 한 요인을 통합 분석하여 교대근무의 건강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제7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교대근무 형태가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매 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 구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을 도출할 수 있 다.
첫째, 근무 형태는 수면건강의 주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특히 분할 교대근무와 같은 불규칙한 형 태는 수면장애 수준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 닌, 조직 차원의 근무체계 설계가 근로자의 수면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근로자의 연령과 가족 구성요소인 결혼 여부 와 자녀 유무는 수면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으며, 이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수면 건강의 위험 군을 선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주관적 안녕감은 수면장애 수준을 유의하게 낮추는 정서적 보호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조직 내 정서적 복지 향상 프로그램이 신체 건강 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교대근무 와 수면장애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매개 변수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이지 않아, 교대근무 자체의 영향은 독립적이고 구조적 인 특성이 강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수면건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단순히 개인 요인만 이 아니라 근무 형태와 같은 외재적 조건이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 으며, 조직과 정책 차원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제7차 근로환경조사의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 였으므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표본에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노화와 수면 간 의 생리적 관계가 교대근무 효과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수면장애는 자기 보고식 문항을 기반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임상적 수면장애 수준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교대 근무와 수면장애 간의 인과 경로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생체리듬 지표나 수면다원 검사(polysomnography)와 같은 객관적 측정 도구 를 활용한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연령 분포를 고 려한 층화 분석이나, 사회적 지지·직무요구도와 같 은 추가 요인을 포함한 다차원적 모형 분석을 통 해 보다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