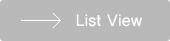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한국 사회는 수도권과 광역도시로의 인구 집중, 지방 중소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 구조를 오랫동안 경험해 왔다[1]. 이러한 인구이동 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연령 및 계층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지역 간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다[2][3]. 과거에는 시도 단위의 평균값 에 기반해 전국적 경향을 설명하는 분석이 일반적 이었으나, 최근에는 시군구 단위에서의 미시적 편 차가 더욱 중요한 분석 단위로 부상하고 있다[4].
2017-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 가 한층 두드려졌다. 이 기간 고령화율은 14.21%에 서 18.96%로 급격히 상승했지만 생산가능인구 비 율은 72.69%에서 70.01%로, 유소년인구 비율은 13.11%에서 11.04%로 하락하여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합계출산 율은 1.05명에서 0.72명으로 급감하여 초저출산 구 조가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증감률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인구 자연 감소가 본격화되었으며, 성비 역시 같은 기간 99.74에서 99.25로 점차 낮아져 여성 인구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의료 공급 자원 측면에 서도 인구 천 명당 병상수와 의사 수가 각각 13.6 개, 2.8명에서 13.9개, 3.2명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전국 평균 수치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2][24]. 재정자립도는 47.2%에서 45.0%로 하락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25], 이는 지역 보건 정책 추진 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방 소멸 위험’, ‘인구 감 소 지역’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Masuda[5]는 지역의 인구 재생산 가능성과 존속 가능성에 주목하여, 20-39세 여성 인구를 핵 심 지표로 삼은 ‘지방 소멸 지수’를 제안하였다. 그 는 젊은 여성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인구 재 생산 기능이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존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에서는 Lee[6]가 이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별 가임기 여성 인구 수를 65세 고 령 인구 수를 나눈 값을 ‘소멸 위험지수’라고 정의 하고, 인구 감소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이 지표를 활용해 2021 년부터 지방 소멸 위험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대 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7].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 에 진행되며 연령 구조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8], 이는 교육, 복지, 보건 등 공공서비스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정책 자원의 배분에서 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10]. Lee[11]는 이러한 인 구구조 변화가 단기적인 통계 지표의 문제가 아닌,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동반하는 중장기 과 제임을 강조하며, 지역 차원의 맞춤형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영역 중 하나이다. 청년층의 유출 과 고령 인구의 집중은 의료수요의 불균형을 유발 하며, 이는 진료과목 간 이용량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보건의료 접근성 격차가 심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 다[12][13]. 기존의 보건의료 관련 연구는 거의 의 료이용량의 총량 변화에 초점을 맞추거나, 특정 진 료과목 또는 단일 인구지표에 한정된 분석에 머무 는 경우가 많았다[14][15][16]. 특히 진료과목별로 인구지표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반응을 정량적 으로 측정한 실증 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진료과목별로 인구지표 변화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반응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활용하여, 고령화 율, 출산율 등의 인구지표 변화가 각 진료과목의 진료건수 및 진료인원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 로 검토하였다.
실제로 진료과목별 의료수요는 인구구조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7]. 예를 들어 산부인과는 청년 여성 인구와 출산율 저하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18], 정신건강의학과는 고령화, 사회적 고립, 만 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과 구조적으로 연관된다 [19]. 그러나 이와 같은 진료과목 특성과 인구 변화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분석은 드물며, 이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진료과목별 의 료이용량(진료건수 및 진료인원)에 미치는 영향을 시군구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의료서비스 이용은 단지 개인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 보건 자원 분포, 인구구조 등의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20]. Andersen[21]이 제시한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은 이러한 요인을 선행요인(Predisposing), 촉진요인 (Enabling), 필요요인(Need)으로 구분하며, 이후 지 역 단위 분석으로 확장되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분석 변수로는 고령화율, 출산율, 인구증감률 등 핵심 인구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들이 진료과목별 의료이용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고정 효과 패널모형으로 검증한다. 이때, Andersen[21]의 건강서비스이용행동모형을 이론적 틀로 삼아, 인구 지표(예: 고령화율, 출산율 등)를 선행요인으로, 지 역 내 보건 자원(천 명당 의사 수, 병상수 등)을 촉 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보 건 자원의 형평성, 진료과목별 의료 접근성의 격차 를 해석하고, 정책적 자원 배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국 228개 시군구 단위의 2017-2023 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율, 출산율, 인구증감률, 유소년인구 비율 등)가 진료과목별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 정효과 패널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과정에서 인구 천 명당 의 사 수, 병상수 등의 보건 자원과 재정자립도 등 경 제적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구지표가 의료이 용량에 대해 독립적인 설명력을 갖는지를 확인한 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 자원 분포와 진료과목 별 의료 접근성의 차이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 인구구조 변화는 진료과목별 의료이 용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진료과목별 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보건의료 자원 및 재정 여건 등 통제변수 를 고려하더라도 지역 인구구조 변화는 의료이용 에 독립적인 설명력을 가진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진료과목별 의료이용량에 대한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고 정효과 패널모형(Fixed Effects Panel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 단위는 전국 228개, 시 군구×연도×진료과목별 불균형 패널자료이며, 시군 구별 고정된 지역 특성과 연도별 외적 충격을 통 제함으로써, 인구지표의 시간적 변화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통계 자료의 총 50여 개의 진료과목 중 통계적 일관성, 지역 간 비교 가능성, 자료 누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5개 주 요 진료과목이다. 분석 결과는 진료과목별로 제시 되며, 회귀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을 중심으 로 인구지표 변화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료과목별 특성과 인구구 조 변화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보건의료수요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7-2023년의 전국 228 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료과목별 의료이용량과 인구구조, 보건의료 자원 지표를 수집하여 패널 데 이터를 구축하였다. 진료건수 및 진료인원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통계를 활용하였고, 인구구조 변수는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자원 지표 는 보건복지부 및 KOSIS에서 수집하였다. 재정자 립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계를 기반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행 정구역을 정비하였다. 종속변수인 진료과목별 의료 이용량에는 일부 값이 0으로 기록된 사례가 있어, 분포 안정화를 log(x+1)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 렇게 구성된 시군구×연도×진료과목 단위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인구구조 변화가 진료과목별 의 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3. 변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진료과목별 의료이용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의료이용의 양적 규모와 수혜 인구 범위를 이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 두 지표를 활용하였다.
두 변수 모두 시군구×연도×진료과목 단위로 구 성된 패널자료에서 사용되며, 분석 과정에서 일부 관측값이 0으로 기록된 사례가 있어 분포의 왜도 해소 및 분산 안정화를 위해 log(x+1) 변환을 적용 하였다.
2) 독립변수
시군구 단위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을 반영 하기 위해 연도별로 측정된 인구지표로 구성하였 다[15]. 각 변수는 지역 내 연령 및 이동 특성을 포괄하며, 진료과목별 의료수요 구조를 설명하는 기반 지표로 활용하였다.
-
(1) 고령화율: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노인 의료 및 만성질환 진료 수요 반영)
-
(2) 유소년인구 비율: 전체 인구 중 0-14세 인구 비율(소아 등 유소년 대상 진료 수요 반영)
-
(3) 생산가능인구 비율: 전체 인구 중 15-64세 비율(경제활동인구 및 의료 주 수요 반영)
-
(4) 성비: 남성 인구 수÷여성 인구 수(성별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 진료과목 수요를 설명)
-
(5) 합계출산율: 가임기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산부인과 등 관련 수요의 핵심 지표)
-
(6) 인구증감률: 전년 대비 인구수 변화율(지역 의료수요 기반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 반영)
-
(7) 순이동률: (전입인구–전출인구)÷총인구(인구 이동 방향성으로 지역 의료수요 흐름 반영)
모든 변수는 시간 종속적이며, 시군구·연도 고 정효과를 통제한 회귀모형에 투입되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Andersen[21]의 건강서비스이용행동 모형에 따라, 의료이용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 자원 및 재정 조건을 통제변수 로 설정하였다.
-
(1)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지역 내 활동 의사 수(공급 접근성과 진료 가능성)
-
(2)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지역 내 병상수(의료 서비스 수용 역량 지표)
-
(3) 재정자립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 확보 비율(지역 내 보건 재정 여건 반영)
4. 분석모형
본 연구는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진 료과목별 의료이용량(진료건수 및 진료인원)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 패널모형 (Fixed Effects Panel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 였다. 분석 단위는 시군구×연도×진료과목으로 수 성된 불균형 패널이며, 일부 연도에서 종속변수가 0인 관측치가 있어 분포 왜도와 분산 안정화를 위 해 log(x +1) 변환을 적용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Hausman test) 결과, 5% 유의수준에서 무작위효 과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채택하였다.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Yijt : 지역 j, 진료과목 i, 연도t 에서의 진료 건수 또는 진료인원
-
αi : 지역 고정효과(시군구 단위 특성 통제),
-
Xjt : 지역 인구구조 및 통제변수로 구성된 설 명변수 행렬
-
γt : 연도 고정효과(공통시점 충격 통제), ∈ijt : 오차항
분석은 R 4.4.3 버전의 plm 패키지를 활용해 진 료과목별 독립적으로 회귀모형을 실행하였다.
5. 인구지표 변화율 상하위 그룹별 비교·분석
고정효과 패널모형은 지역별 불변 특성을 통제 한 상태에서 평균적 효과를 추정하는 데 유용하나, 개별 지역의 세부 변화 양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국 228개 시군구의 2017-2023년의 자료로 주요 인구지표(고령화율·합 계출산율·순이동률 등)의 연평균 변화율을 산출한 뒤, 각 지표별 연평균 변화율을 기준으로 상위 25%와 하위 25%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각 그룹의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이용량을 비교해 평균 효과가 아닌 지역별 변화 속도와 상대적 위치에 따른 의 료이용 양상의 이질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패 널모형 해석의 맥락을 보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시도별 인구 및 보건지표 연평균 변화율 분 석
<Table 1>은 2017-2023년 전국 및 시도별 주요 인구·보건지표 연평균 변화율을 제시한 표로, 시군 구 단위 회귀분석에 앞서 지역별 보건의료 환경의 전반적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이 절의 결과는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Table 1>
Compound Annual Growth Rates (CAGR) of Key Demographic and Health Indicators by Region (National and Provincial Levels, 2017–2023)
Notes: CAGR (%) = ((Value in 2023 ÷ Value in 2017)^(1/6) − 1) × 100.
Percentage indicators are expressed in percentage points; medical resource indicators are expressed per 1,000 population.
Source: Statistics Korea KOSIS (2024);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book; Local Finance Statistics System.
| Region | Aging_ Rate | Working_ Rate | Youth_ Rate | Sex_ Ratio | Fertility | Beds | Doctors | Fiscal_ Independence |
|---|---|---|---|---|---|---|---|---|
| Korea (national total) | 4.93 | -0.62 | -2.83 | -0.08 | -6.10 | 0.24 | 2.25 | -0.79 |
| Seoul | 4.98 | -0.58 | -3.35 | -0.42 | -6.68 | 1.46 | 3.36 | -1.08 |
| Busan | 5.62 | -1.19 | -2.06 | -0.34 | -6.22 | 0.64 | 2.45 | -2.30 |
| Daegu | 5.75 | -0.86 | -2.63 | -0.32 | -6.74 | 2.55 | 2.91 | -0.85 |
| Incheon | 5.98 | -0.64 | -2.74 | -0.11 | -6.02 | 0.87 | 2.71 | -2.37 |
| Gwangju | 4.92 | -0.39 | -3.00 | -0.11 | -6.45 | -0.36 | 1.34 | -0.95 |
| Daejeon | 5.91 | -0.54 | -3.34 | -0.08 | -5.06 | -0.31 | 1.87 | -3.04 |
| Ulsan | 8.04 | -0.84 | -2.68 | -0.04 | -7.04 | 1.22 | 1.40 | -3.11 |
| Sejong | 2.34 | 0.18 | -1.84 | -0.05 | -8.62 | 2.29 | 5.77 | -0.23 |
| Gyeonggi-do | 5.33 | -0.42 | -2.89 | 0.00 | -5.40 | 0.16 | 2.71 | -0.22 |
| Gangwon-do | 4.85 | -1.01 | -2.70 | -0.04 | -3.75 | -1.18 | 1.98 | 0.88 |
| Chungcheongbuk-do | 4.70 | -0.69 | -2.89 | 0.24 | -5.38 | -0.50 | 0.71 | 1.13 |
| Chungcheongnam-do | 3.71 | -0.46 | -2.98 | 0.27 | -6.69 | -0.62 | 0.71 | -0.34 |
| Jeollabuk-do | 4.11 | -0.70 | -3.33 | 0.03 | -6.28 | 0.31 | 1.65 | 1.09 |
| Jeollanam-do | 3.25 | -0.68 | -2.78 | 0.27 | -5.03 | 0.69 | 1.34 | 3.01 |
| Gyeongsangbuk-do | 4.42 | -0.93 | -2.78 | 0.16 | -6.12 | -0.10 | 1.60 | -0.58 |
| Gyeongsangnam-do | 5.52 | -0.80 | -3.03 | 0.01 | -6.90 | 0.72 | 2.06 | -2.28 |
| Jeju | 4.01 | -0.42 | -2.36 | -0.20 | -7.32 | 0.45 | 1.98 | -0.20 |
1)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율과 출산율
고령화율은 모든 시도에서 상승했으며, 울산 (+8.04%), 대전(+5.91%)은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세 종특별자치시(+2.34%)와 전라남도(+3.25%)는 상대 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합계출산율은 전 지역에서 내림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세종특별자치 시(-8.62%)와 제주특별자치도(-7.32)에서 가장 큰 폭 으로 하락했다.
2) 의료 공급 자원: 병상수와 의사 수
의료 기반 확충 속도는 지역 간 편차가 두드러 졌다. 의사 수의 증가율은 세종특별자치시(+5.77%), 서울(+3.3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북도 (+0.71%), 전라남도(+1.3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병상수도 지역별로 증감 추이가 다르고, 일부 지역 은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였다.
3) 재정 여건: 재정자립도 변화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시도에서 하락했으며, 부 산(-2.30%), 인천(-2.37%), 울산(-3.11%) 등 대도시권 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고령화율, 출산율, 의료 공 급 자원(의사 수·병상수), 재정자립도 등 주요 인 구·보건 지표가 시도별로 다른 양상이 보임을 확 인한 것이다[22].
2. 진료과목별 기초 통계량 분석
시군구 단위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진료과목별 의료이용 규모와 변동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활용하여 기초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분석 대상은 15개 주요 진료 과목이며, 각 과목에 대해 연도별 전국 합산 기준 의 연평균 값, 표준편차, 변화율(%), 연평균 성장률 (CAGR)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Table 2>은 진료과목별 평균 의료이용 규모와 지역 간 편차(표준편차)를 함께 제시해, 의료수요 가 높은 과목과 지역 간 변동성이 큰 과목을 식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이후 시 군구 단위 패널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기반 자료로 활용된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nual Growth Rates of Total Medical Service Utilization by Clinical Specialty (2017–2023)
Notes: Change rate (%) = ((Value in 2023 − Value in 2017) ÷ Value in 2017) × 100.
CAGR (%) = ((Value in 2023 ÷ Value in 2017)^(1/6) − 1) × 100.
Unit: Persons, cases, percent (%).
Source: Statistics Korea KOSIS (2024);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Annual Average No. of total Medical Visits | Standard Deviation of Total Medical Visits | Change Rate of Total Medical Visits | CAGR of Total Medical Visits | Clinical Specialty | Annual Average No. of Total Patients | Standard Deviation of Total Patients | Change Rate of Total Patients | CAGR of Total Patients |
|---|---|---|---|---|---|---|---|---|
| 241,213,916 | 24,257,347 | 10.75 | 1.72 | Internal Medicine | 36,569,572 | 3,129,518 | 11.01 | 1.76 |
| 123,353,806 | 3,094,589 | -0.27 | -0.05 | Orthopedic Surgery | 20,410,336 | 757,161 | 8.34 | 1.34 |
| 65,589,292 | 14,659,780 | 26.35 | 3.97 | Otorhinolaryngology | 17,700,480 | 3,027,177 | 23.21 | 3.54 |
| 42,949,044 | 1,617,519 | 0.44 | 0.07 | Ophthalmology | 15,705,701 | 531,776 | 3.99 | 0.65 |
| 36,506,967 | 683,090 | 1.34 | 0.22 | Dermatology | 12,838,032 | 154,359 | 1.14 | 0.19 |
| 27,254,606 | 975,120 | 0.18 | 0.03 | General Surgery | 7,549,759 | 436,660 | 6.15 | 1.00 |
| 25,363,310 | 508,069 | 0.88 | 0.15 | Obstetrics and Gynecology | 6,621,219 | 301,335 | 7.67 | 1.24 |
| 22,013,555 | 2,513,431 | 20.83 | 3.20 | Family Medicine | 5,770,455 | 1,007,616 | 34.11 | 5.01 |
| 36,512,440 | 8,604,753 | -1.58 | -0.27 | Pediatrics | 5,748,867 | 907,799 | 4.71 | 0.77 |
| 18,492,215 | 502,617 | 8.45 | 1.36 | Urology | 5,540,521 | 156,566 | 7.9 | 1.28 |
| 7,150,811 | 764,043 | 4.32 | 0.71 | Emergency Medicine | 4,830,400 | 431,394 | 0.24 | 0.04 |
| 15,565,931 | 915,044 | 11.87 | 1.89 | Neurosurgery | 4,112,575 | 304,237 | 14.65 | 2.31 |
| 13,171,574 | 1,081,262 | 23.56 | 3.59 | Neurology | 3,786,911 | 356,369 | 27.36 | 4.11 |
| 20,596,179 | 3,471,228 | 59.3 | 8.07 | Psychiatry | 2,920,254 | 469,244 | 55.67 | 7.66 |
| 1,514,139 | 158,961 | 26.42 | 3.98 | Plastic Surgery | 469,022 | 41,666 | 20.57 | 3.17 |
분석 결과, 내과는 연평균 진료인원이 약 3,657 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건수 변화율은 10.75%, 진료인원 변화율은 11.01%로 나타났다. 정 형외과는 진료건수가 연평균 약 1억 2,335만 건으 로 전체 과목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진료인원은 연 평균 약 2,041만 명이었다. 진료건수 변화율은 – 0.27%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진료인원은 8.34% 증가하였다. 산부인과는 진료건수 변화율이 0.88% 였고, 진료인원은 연평균 약 662만 명으로 집계되 었다. 진료인원의 표준편차는 약 30만 명으로, 지 역 간 일정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아청소년과는 진료건수 변화율 –1.58%, 진료인원 변화율 4.71%를 기록하였다. 한편, 정신 건강의학과는 진료인원 변화율이 55.67%로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가정의학 과 (34.11%), 신경과(27.36%) 등도 높은 진료인원 변화율을 나타냈다.
3. 진료과목별 의료이용에 대한 고정효과 회귀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2017-2023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진료과목별 의료이용량(진료건수·진료인원)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한 결과를 제시한다. 총 15개 진료과목을 분석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Table 3>는 진료건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한 결과다. 산부인과는 합계출산율(p<0.001), 성비 (p<0.001), 인구증감률(p<0.001), 순이동률 (p<0.001), 재정자립도(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는 합계출산율 (p<0.01), 인구증감률(p<0.001), 순이동률(p<0.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정신건강의학 과는 합계출산율(p<0.01), 성비(p<0.001), 인구증감 률( p<0.001), 순이동률(p<0.001), 의사 수(p<0.001), 병상수(p<0.001)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고, 내과는 합계출산율(p<0.001), 성비(p<0.05)와 유의하였다. 응급의학과는 성비(p<0.05), 합계출산율(p<0.05), 인 구증감률(p<0.001), 순이동률(p<0.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신경외과는 합계출산 율(p<0.001), 인구증감률(p<0.001), 순이동률 (p<0.001)에서, 신경과는 성비(p<0.001), 인구증감률 (p<0.001), 순이동률(p<0.001), 재정자립도(p<0.001) 에서 모두 유의성이 나타났다. 가정의학과는 고령 화율(p<0.05), 유소년인구 비율(p<0.05), 생산가능인 구 비율(p<0.05)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3>
Fixed-Effects Panel Regression Results for the Number of Total Medical Visits by Clinical Specialty
Notes: Dependent variable = log(Number of visits + 1).
Unit of coefficients is “cases” for the number of visits.
*, **, and *** = p < 0.05, ** p < 0.01, *** and p < 0.001, respectively.
| Clinical Specialty | Aging_Rate | Youth_Rate | Working_Rate | Sex_Ratio | Fertility | Population_ Change | Migration_ Rate | Doctors | Beds | Fiscal_ Independence |
|---|---|---|---|---|---|---|---|---|---|---|
| Internal Medicine | 0.047 (p=0.491) | -0.006 (p=0.934) | 0.055 (p=0.418) | -0.006 (p=0.047)* | 0.104 (p=0.001)*** | 0.008 (p=0.517) | -0.011 (p=0.408) | 0.024 (p=0.06) | -0.004 (p=0.072) | 0.002 (p=0.128) |
| Orthopedic Surgery | -0.049 (p=0.231) | -0.053 (p=0.195) | -0.022 (p=0.583) | -0.012 (p=001)*** | 0.025 (p=0.131) | -0.004 (p=0.569) | 0.001 (p=0.904) | 0.037 (p=0.001)*** | -0.004 (p=0.001)*** | -0.006 (p=0.001)*** |
| Otorhinolaryngology | 0.036 (p=0.814) | -0.074 (p=0.63) | 0.048 (p=0.754) | -0.009 (p=0.208) | 0.078 (p=0.207) | 0.295 (p=0.001)*** | -0.308 (p=0.001)*** | 0.032 (p=0.261) | -0.017 (p=0.001)*** | 0.016 (p=0.001)*** |
| Ophthalmology | -0.027 (p=0.559) | -0.029 (p=0.528) | -0.012 (p=0.792) | -0.012 (p=0.001)*** | -0.003 (p=0.889) | 0.043 (p=0.001)*** | -0.049 (p=0.001)*** | 0.001 (p=0.904) | -0.002 (p=0.245) | -0.001 (p=0.594) |
| Dermatology | 0.003 (p=0.943) | 0.016 (p=0.676) | 0.019 (p=0.617) | -0.014 (p=0.001)*** | -0.009 (p=0.566) | -0.008 (p=0.29) | 0.002 (p=0.794) | 0.014 (p=0.05)* | -0.005 (p=0.001)*** | -0.007 (p=0.001)*** |
| General Surgery | 0.037 (p=0.609) | 0.025 (p=0.733) | 0.055 (p=0.443) | -0.012 (p=0.001)*** | 0.052 (p=0.072) | -0.021 (p=0.12) | 0.016 (p=0.246) | 0.011 (p=0.392) | -0.001 (p=0.741) | -0.003 (p=0.036)* |
| Obstetrics and Gynecology | 0.004 (p=0.934) | 0.006 (p=0.907) 0.018 | (p=0.727) | -0.01 (p=0.001)*** | 0.141 (p=0.001)*** | -0.047 (p=0.001)*** | 0.045 (p=0.001)*** | -0.005 (p=0.613) | -0.003 (p=0.05) | -0.005 (p=0.001)*** |
| Family Medicine | 0.363 (p=0.013)* | 0.308 (p=0.036)* | 0.357 (p=0.015)* | -0.01 (p=0.172) | 0.103 (p=0.079) | -0.046 (p=0.097) | 0.045 (p=0.117) | -0.001 (p=0.971) | 0.018 (p=0.001)*** | -0.002 (p=0.583) |
| Pediatrics | -0.006 (p=0.977) | -0.051 (p=0.798) | 0.006 (p=0.975) | 0.003 (p=0.717) | 0.246 (p=0.002)** | 0.227 (p=0.001)*** | -0.235 (p=0.001)*** | -0.036 (p=0.328) | -0.001 (p=0.805) | 0.014 (p=0.001)** |
| Urology | 0.019 (p=0.667) | 0.005 (p=0.916) | 0.016(p=0.719) | 0.002 (p=0.381) | -0.015 (p=0.392) | 0.006 (p=0.456) | -0.008 (p=0.328) | -0.002 (p=0.835) | 0 (p=0.904) | -0.003 (p=0.001)*** |
| Emergency Medicine | -0.062 (p=0.651) | -0.1 (p=0.462) | -0.039 (p=0.778) | 0.014 (p=0.028)* | 0.111 (p=0.042)* | -0.1 (p=0.001)*** | 0.106 (p=0.001)*** | -0.017 (p=0.504) | -0.002 (p=0.562) | -0.004 (p=0.154) |
| Neurosurgery | 0.014 (p=0.867) | -0.03 (p=0.726) | 0.025 (p=0.772) | 0.004 (p=0.318) | 0.161 (p=0.001)*** | -0.072 (p=0.001)*** | 0.069 (p=0.001)*** | 0.007 (p=0.649) | 0.003 (p=0.297) | -0.012 (p=0.001)*** |
| Neurology | -0.084 (p=0.257) | -0.13 (p=0.08) | -0.085 (p=0.254) | -0.027 (p=0.001)*** | 0.045 (p=0.129) | -0.074 (p=0.001)*** | 0.073 (p=0.001)*** | 0.006 (p=0.646) | -0.001 (p=0.821) | -0.009 (p=0.001)*** |
| Psychiatry | -0.019 (p=0.773) | -0.11 (p=0.094) | -0.031 (p=0.636) | -0.026 (p=0.001)*** | -0.07 (p=0.008)** | -0.109 (p=0.001)*** | 0.108 (p=0.001)*** | 0.076 (p=0.001)*** | -0.011 (p=0.001)*** | -0.008 (p=0.001)*** |
| Plastic Surgery | -0.018 (p=0.922) | -0.105 (p=0.574) | -0.021 (p=0.909) | -0.01 (p=0.271) | 0.079 (p=0.292) | -0.119 (p=0.001)*** | 0.118 (p=0.001)** | -0.067 (p=0.051) | 0.018 (p=0.001)** | 0 (p=0.986) |
<Table 4>는 진료인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패 널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주요 진 료과목에서 인구구조 변수와 보건의료 지표가 통 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 과는 합계출산율(p<0.001), 성비(p<0.001), 인구증감 률(p<0.001), 순이동률(p<0.001), 병상수(p<0.01), 재 정자립도(p<0.001)가 유의하였다. 소아청소년과는 합계출산율(p<0.001)과 의사 수(p<0.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성비 (p<0.001), 합계출산율(p<0.05), 인구증감률 (p<0.001), 순이동률(p<0.001), 의사 수(p<0.001), 병 상수(p<0.001), 재정자립도(p<0.001)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내과는 합계출산율(p<0.01), 인구증감률 (p<0.05), 순이동률(p<0.05), 병상수(p<0.01)에서 유 의성을 보였다. 응급의학과는 성비(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신경외과는 합계 출산율(p<0.001), 인구증감률(p<0.001), 순이동률 (p<0.001), 재정자립도(p<0.001)에서 유의하였다. 신 경과는 성비(p<0.001), 인구증감률(p<0.001), 순이동 률(p<0.001), 재정자립도(p<0.001)가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 가정의학과는 고령화율(p<0.001), 유소년인 구 비율(p<0.01), 생산가능인구 비율(p<0.001) 등 다수 변수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Table 4>
Fixed-Effects Panel Regression Results for the Number of Total Patients by Clinical Specialty
Notes: Dependent variable = log(Number of visits + 1).
Unit of coefficients is “persons” for the number of patients.
*, **, and *** = p < 0.05, ** p < 0.01, *** and p < 0.001, respectively.
| Clinical Specialty | Aging_Rate | Youth_Rate | Working_Rate | Sex_Ratio | Fertility | Population_ Change | Migration_ Rate | Doctors | Beds | Fiscal_ Independence |
|---|---|---|---|---|---|---|---|---|---|---|
| Internal Medicine | 0.03 (p=0.675) | -0.009 (p=0.904) | 0.024 (p=0.743) | -0.005 (p=0.173) | 0.08 (p=0.006)** | 0.03 (p=0.026)* | -0.034 (p=0.015)* | 0.007 (p=0.596) | -0.007 (p=0.002)** | -0.001 (p=0.363) |
| Orthopedic Surgery | 0.009 (p=0.842) | -0.006 (p=0.894) | 0.011 (p=0.81) | -0.006 (p=0.005)** | 0.009 (p=0.605) | 0.003 (p=0.724) | -0.008 (p=0.376) | 0.009 (p=0.26) | -0.006 (p=0.001)*** | -0.005 (p=0.001)*** |
| Otorhinolaryngology | 0.038 (p=0.759) | -0.06 (p=0.631) | 0.041 (p=0.745) | -0.014 (p=0.016)* | 0.054 (p=0.283) | 0.222 (p=0.001)*** | -0.231 (p=0.001)*** | 0.027 (p=0.244) | -0.014 (p=0.001)*** | 0.008 (p=0.002)** |
| Ophthalmology | -0.015 (p=0.752) | -0.019 (p=0.677) | -0.013 (p=0.789) | -0.009 (p=0.001)*** | 0.01 (p=0.596) | 0.04 (p=0.001)*** | -0.047 (p=0.001)*** | -0.003 (p=0.729) | -0.004 (p=0.011)* | -0.002 (p=0.067) |
| Dermatology | 0.011 (p=0.774) | 0.024 (p=0.532) | 0.02 (p=0.606) | -0.011 (p=0.001)*** | 0.006 (p=0.681) | 0.012 (p=0.097) | -0.018 (p=0.016)* | 0.009 (p=0.213) | -0.005 (p=0.001)*** | -0.006 (p=0.001)*** |
| General Surgery | 0.09 (p=0.201) | 0.066 (p=0.347) | 0.097 (p=0.17) | -0.006 (p=0.092) | 0.032 (p=0.259) | -0.012 (p=0.367) | 0.009 (p=0.506) | 0 (p=0.979) | -0.004 (p=0.055) | -0.001 (p=0.394) |
| Obstetrics and Gynecology | 0.01 (p=0.859) | 0.002 (p=0.966) | 0.013 (p=0.829) | -0.019 (p=0.001)*** | 0.084 (p=0.001)*** | -0.053 (p=0.001)*** | 0.052 (p=0.001)*** | -0.003 (p=0.775) | -0.005 (p=0.002)** | -0.007 (p=0.001)*** |
| Family Medicine | 0.479 (p=0.001)*** | 0.395 (p=0.004)** | 0.462 (p=0.001)*** | -0.015 (p=0.02)* | 0.123 (p=0.026)* | -0.087 (p=0.001)*** | 0.092 (p=0.001)*** | -0.008 (p=0.749) | 0.013 (p=0.002)** | -0.002 (p=0.475) |
| Pediatrics | -0.033 (p=0.808) | -0.07 (p=0.612) | -0.043 (p=0.756) | 0 (p=0.963) | 0.219 (p=0.001)*** | 0.006 (p=0.801) | -0.007 (p=0.793) | -0.052 (p=0.039)* | 0.002 (p=0.646) | -0.003 (p=0.375) |
| Urology | 0.027 (p=0.615) | 0.021 (p=0.7) | 0.018 (p=0.732) | 0.001 (p=0.813) | -0.009 (p=0.677) | 0.026 (p=0.008)** | -0.03 (p=0.004)** | 0.009 (p=0.373) | -0.004 (p=0.015)* | -0.004 (p=0.002)** |
| Emergency Medicine | -0.096 (p=0.372) | -0.122 (p=0.258) | -0.081 (p=0.453) | 0.017 (p=0.001)** | 0.069 (p=0.108) | 0.009 (p=0.642) | -0.008 (p=0.692) | -0.024 (p=0.217) | -0.004 (p=0.215) | 0.001 (p=0.719) |
| Neurosurgery | 0.088 (p=0.268) | 0.036 (p=0.65) | 0.091 (p=0.251) | 0.003 (p=0.418) | 0.162 (p=0.001)*** | -0.064 (p=0.001)*** | 0.063 (p=0.001)*** | 0.002 (p=0.915) | 0.001 (p=0.831) | -0.012 (p=0.001)*** |
| Neurology | -0.058 (p=0.438) | -0.108 (p=0.144) | -0.068 (p=0.361) | -0.027 (p=0.001)*** | 0.029 (p=0.328) | -0.057 (p=0.001)*** | 0.056 (p=0.001)*** | 0.003 (p=0.812) | -0.003 (p=0.131) | -0.009 (p=0.001)*** |
| Psychiatry | 0.009 (p=0.893) | -0.084 (p=0.21) | -0.013 (p=0.843) | -0.022 (p=0.001)*** | -0.057 (p=0.033)* | -0.06 (p=0.001)*** | 0.056 (p=0.001)*** | 0.048 (p=0.001)*** | -0.012 (p=0.001)*** | -0.008 (p=0.001)*** |
| Plastic Surgery | -0.003 (p=0.987) | -0.077 (p=0.703) | -0.003 (p=0.987) | 0 (p=0.97) | 0.05 (p=0.536) | -0.079 (p=0.036)* | 0.079 (p=0.043)* | -0.054 (p=0.145) | 0.019 (p=0.001)** | 0.003 (p=0.544) |
그 외 이비인후과, 안과 등 일부 과목은 진료건 수 및 진료인원 분석에서 일부 유의성이 확인되었 으나, 효과가 작거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아 상세 해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회귀분석은 전국 시군구 단위의 패널 데이터 를 활용해 인구지표 변화가 진료과목별 의료이용 에 미치는 시간적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이 다. 분석 결과, 출산율·순이동률·인구증감률 등 일 부 인구지표가 특정 진료과목에서 유의한 설명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구조 변화가 의 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회귀계수 해석만으로는 개별 지역별 변화 양상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주요 인구지 표 변화율 속도를 기준으로 상하위 그룹을 구분하 고 진료과목별 의료이용 변화를 기술통계적으로 추가 분석하였다.
4. 시군구 단위 인구지표 변화율 그룹에 따른 진료과목별 의료이용 분석
본 절에서는 시군구별 인구지표 변화 속도에 따 른 의료이용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령화율·합계출산율·순이동률 등 주요 인구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 군구를 상위 25%와 하위 25%로 구분하고, 내과·산 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건수·진료인원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 다. 상하위 그룹 구분은 지표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변화율의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군구 별 인구구조 변화 속도를 반영한다.
<Table 5>은 연구기간(2017-2023년) 동안 각 인구 지표의 변화 속도 기준으로 상위 25% 및 하위 25% 그룹을 구분, 각 그룹의 대표 지역과 평균 변화율, 그리고 해당 그룹에서의 주요 진료과목별 의료이용 변화율 평균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5>
Comparison of Average Growth Rates in Medical Service Utilization for Key Clinical Specialties by Population Indicator Groups (Top vs. Bottom 25%)
Notes: Unit = percent (%). Representative region: the si/gun/gu with the highest or lowest change rate within each group.
Group average growth rate: mean change rate (%) from 2017 to 2023 for all si/gun/gu in each group.
Sour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tatistics Korea KOSIS (2017–2023).
| Population Indicator | Group | Representative Region | Group Average Growth Rate | Average Growth Rate of Total Patients | Average Growth Rate of Total Medical Visits | ||||||||
|---|---|---|---|---|---|---|---|---|---|---|---|---|---|
| Internal Medicine | Obstetrics and Gynecology | Pediatrics | Emergency Medicine | Psychiatry | Internal Medicine | Obstetrics and Gynecology | Pediatrics | Emergency Medicine | Psychiatry | ||||
| Aging_Rate | Top | Dong-Gu, Ulsan | 48.45 | 7.92 | 1.75 | 6.17 | -1.63 | 52.76 | 8.5 | -6.58 | -2.68 | 4.73 | 53.72 |
| Bottom | Jung-Gu, Daegu | 18.28 | 8.38 | 6.57 | 6.25 | 14.16 | 48.61 | 4.62 | 3.92 | 3.14 | 25.41 | 52.75 | |
| Youth_Rate | Top | Hwaseong - Si Gyeonggi-Do | -9.44 | 21.91 | 19.46 | 26.36 | 9.18 | 67.34 | 13.93 | 10.56 | 16.82 | 21.15 | 68.47 |
| Bottom | Jung-Gu, Busan | -25.88 | 2.61 | -5.48 | -6.54 | 1.54 | 42.91 | 1.23 | -11.81 | -16.85 | 5.21 | 44.13 | |
| Working_Rate | Top | Hwaseong-Si Gyeonggi-Do | -1.64 | 15.69 | 14.74 | 9.65 | 7.52 | 68.01 | 15.73 | 8.75 | 4.44 | 12.46 | 75.79 |
| Bottom | Goesan - Gun Chungcheongbuk-Do | -9.54 | 11.96 | -0.18 | 13.09 | 8.26 | 44.65 | -2.11 | -10.84 | -2.99 | 16.59 | 33.86 | |
| Sex_Ratio | Top | Uiryeong - Gun Gyeongsangnam-Do | 3.09 | 9.83 | -2.46 | 6.70 | 9.05 | 47.84 | 1.30 | -8.76 | -5.30 | 18.2 | 41.32 |
| Bottom | Hwache on - Gun, Gangwon-Do | -2.62 | 9.18 | 7.84 | 5.05 | -1.92 | 55.38 | 6.57 | -1.77 | -4.02 | 3.17 | 59.05 | |
| Fertility | Top | Gwacheon - Si Gyeonggi-Do | -11.41 | 21.83 | 11.9 | 24.35 | 4.27 | 55.48 | 4.4 | 2.13 | 9.32 | 6.11 | 44.68 |
| Bottom | Jung-Gu, Busan | -42.37 | 3.45 | -0.9 | -3.51 | 1.32 | 44.54 | 3.16 | -9.06 | -7.86 | 5.35 | 50.22 | |
| Population_ Change | Top | Yeong wo l - Gun Gangwon-Do | 577.79 | 12.26 | 4.08 | 13.41 | 9.72 | 51.86 | 3.81 | -4.89 | 2.79 | 15.89 | 45.62 |
| Bottom | Jangseong -Gun, Jeollanam-Do | -553.94 | 15.25 | 8.03 | 9.82 | 1.98 | 56.48 | 7.94 | 0.52 | 0.60 | 10.97 | 52.54 | |
| Migration_Rate | Top | Goheung - Gun Jeollanam-Do | 482.18 | 10.52 | 4.43 | 10.07 | 6.64 | 49.46 | 4.93 | -3.05 | 3.23 | 13.08 | 47.53 |
| Bottom | Danyang - Gun , Chungcheongbuk-Doo | -1000.65 | 10.29 | 7.68 | 5.53 | 3.95 | 51.70 | 4.90 | 0.15 | -1.33 | 14.18 | 49.17 | |
고령화율 변화율 상위 그룹의 대표 지역은 울산 광역시 동구(평균 변화율 48.45%)로 정신건강의학 과 진료인원 증가율은 52.76%, 진료건수 증가율은 53.72%였다. 반면, 고령화율 변화율 하위 그룹의 대표 지역은 대구광역시 중구(평균 변화율 18.28%) 이며, 진료인원 증가율은 48.61%, 진료건수 증가율 은 52.75%로, 두 그룹 모두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유소년인구 비율 변화율 상위 그룹의 대표 지역 은 경기도 화성시(평균 변화율 -9.44%)로, 산부인과 진료인원 증가율은 19.46%, 진료건수 증가율은 10.56%, 소아청소년과 진료인원 증가율은 26.36%, 진료건수 증가율은 16.82%였다. 하위 그룹의 대표 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평균 변화율 -25.88%)이며, 산부인과 진료인원 증가율은 -5.48%, 진료건수 증 가율은 -11.81%, 소아청소년과 진료인원 증가율은 -6.54%, 진료건수 증가율은 -16.85%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변화율 상위 그룹의 대표 지역은 경 기도 과천시(평균 변화율 -11.41%)로, 산부인과 진 료인원 증가율은 11.90%, 진료건수 증가율은 2.13%, 소아청소년과 진료인원은 24.35%, 진료건수 는 9.32%였다. 하위 그룹의 대표 지역은 부산광역 시 중구(평균 변화율 -42.37%)이며, 산부인과 진료 인원은 -0.90%, 진료건수는 -9.06%, 소아청소년과 진료인원은 -3.51%, 진료건수는 -7.86%로 나타났다.
인구증감률 변화율은 상위 그룹(강원도 영월군, +577.79%)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인원 증가율은 51.86%, 진료건수 증가율은 45.62%였고, 하위 그룹 (전라남도 장성군, -553.94%)에서는 진료인원 증가 율 56.48%, 진료건수 증가율 52.54%이 확인되었다. 순이동률 변화율에서는 상위 그룹(전라남도 고흥 군, +482.18%)과 하위 그룹(충청북도 단양군, -1000.65%)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인원 증가율 이 각각 49.46%, 51.70%, 진료건수 증가율은 각각 47.53%, 49.17%로 나타났다.
인구증감률과 순이동률의 극단적 변화율 값은 일부 지역의 2017년 기준 값이 낮아 상대적 비율 변화가 과도하게 확대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가 분석은 인구지표의 절대 적 수준이나 평균 변화율뿐 아니라, 변화율의 상대 적 위치(상하위 그룹)에 따라서도 진료과목별 의료 이용의 반응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찰에서는 시군구 단위 인구구조 변화와 진료과목별 반응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Ⅳ. 고찰
본 연구는 2017-2023년 전국 228개 시군구 단위 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진료과 목별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적용하여 지역의 고유 특성과 연도별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구 지표 변화율을 활용한 그룹 비교 분석을 추가적으 로 실시해, 지역별 구조적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구조 변화는 다수 진료과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가설 1), 그 영향은 진료과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가설 2). 특히 합계출산율, 순이동률, 인구증감률은 산부인 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인구지표에 민감한 진료과목에서 주요한 설명변수로 작용하였 다. 산부인과는 합계출산율이 1단위 증가할 때 진 료건수와 진료인원이 각각 14.1%, 8.4% 증가했으 며, 소아청소년과는 합계출산율과 인구증감률 증가 에 따라 진료건수가 각각 24.6%, 22.7% 증가해 유 소년 인구구조 변화가 의료이용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합계출산율 증가에 진료건수와 진료인원이 감소 하였다. 그리고, 인구증감률 증가 시에도 진료건수 와 진료인원이 각각 –10.9%, –0.6% 감소하여, 인 구감소가 클수록 정신건강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 을 시사한다. 이처럼 인구지표의 영향이 진료과목 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점은 의료이용 변화가 단일 지표의 변화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추가로 실시한 그룹 분석에서 정신건강의학과는 모든 인구지표 그룹에서 진료건수와 진료인원 변화 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33.86%-75.79%). 다만 그룹 간 변화율 차이가 존재하므로 특정 인구지표 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생산가 능인구 비율 변화율 상위 그룹에서 진료건수가 75.79% 증가한 반면 하위 그룹에서는 33.86% 증가 에 그쳤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생산가능인 구층의 사회적 스트레스, 직장 및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수요 증가 가능성을 시사하 며, 동시에 정신건강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지역 환 경 요인 등 복합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23]. 이러한 결과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의 필요성이 특정 인구구조 지표에 한정되지 않음 을 뒷받침한다. 반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출산율 및 유소년인구 비율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 나 인구구조의 변화의 방향성과 속도가 의료수요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통제변수로 포함한 병상수와 의사 수는 일부 진료과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 으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의 진료과목에서 유의성 이 낮거나 음의 계수를 보여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정책 집행 역량 등 간접적 요인을 반영할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지표가 의 료이용 변화에 독립적인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가설 3).
본 연구는 시군구 단위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진료과목별 의료이용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 하였다. Park et al.[14]는 지역 소멸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총 의료이용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했으나 진료과목별 반응성은 다루지 않았다. Lee et al.[16] 역시 소멸위험지수와 만성질환 의료이용 간의 관 계를 분석했으나 특정 질환 중심 분석에 한정되었 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전국 시군구의 단위의 패 널자료를 활용해 진료과목별 수요 변화를 정량화 함으로써 지역 단위 차별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또 한 Park[15]의 연구가 공간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의료이용 불균형의 핵심으로 지목한 점, Jeong & Jun[12]의 연구가 의료 취약지에서 진료 과목별 접근성 불균형을 강조한 점과 맥을 같이하 며,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통해 시군구 고유 특성을 통제하고 인구지표 변화율 기반 분석을 병행해 지 역 간 구조적 차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는 차별 성을 가진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단순한 인구지표 절댓값 이나 평균치가 아닌 변화율과 지역 간 상대적 위 치를 고려한 분석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낮지만 상승 추세인 지역에서는 향 후 산부인과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산부 인과는 전체 의료이용량의 지역 간 편차는 상대적 으로 크지 않았으나, 합계출산율 등 인구지표 변화 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진료과목별 인구 반응 특성에 따른 전략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또한, 패널모 형의 평균효과 중심 해석만으로는 지역 간 이질성 과 진료과목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 로, 변화율 기반 그룹 분석과 같은 보완적 접근이 정책 표적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연구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외생적 충 격이 의료이용 패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소아청소년 과 의원 폐업률은 7.04%로 다른 진료과보다 높았 으며, 환자 급감과 수익 악화가 폐업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9], 이는 단순한 인구구조 변 화 효과와 구분하기 어렵다. 인구지표의 구조적 영 향과 함께 감염병 유행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시군 구 단위를 동일한 분석 틀로 다루었으나, 도시·농 촌, 수도권·비수도권 간 구조적 차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동일한 인구구조 변화라 하더라 도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 되어 공급 기반 자체가 취약할 수 있고,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풍부하여 수요 변화가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이비인후과·안과 등 일부 과목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거나 결과 방향성이 일 관되지 않아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과목 특 성상 인구지표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거나, 데 이터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 추정이 어려웠기 때문 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에서 외생적 충격변수(팬데믹 등) 통제, 지역 유형별 세분화 분 석, 그리고 과목별 의료공급 지표 활용 등을 통합 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보완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17-2023년까지의 전국 228개 시군 구 단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인구구조 변화 가 진료과목별 의료이용량(진료건수 및 진료인원)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변 화율 기반 그룹 비교·분석을 병행하여 단순한 인 구지표 수준을 넘어 진료과목 특성과 지역별 변화 속도의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가 총 의료이용량이나 특정 질환 중심 으로 분석했던 한계를 넘어, 본 연구는 전국 시군 구 단위의 장기 패널자료를 활용해 진료과목별 수 요 변화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지역 간 차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같 은 인구지표 변화라도 지역과 진료과목에 따라 의 료이용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진료과목별 특성과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와 같이 수요가 급감하는 진료과목은 지역별로 의 료 취약지 지정의 확대, 전담 인력 및 재정적 지원 강화,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 로 유지·보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하다. 반대로 정신건강의학과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가능인구 비율 변화가 높은 지역에서 그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 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의 확충, 전문 인력의 배치 확대, 원격 정신 의료 서비스 도입 등 다층적·다각적 대응 전략이 요구 된다. 이러한 과목별 차별적 정책 접근은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의료 자원, 의료 접근성, 건강 보험·복지 정책, 감염병 등 외부 요인을 포괄적으 로 고려하고, 지역 유형별 차별성과 과목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지역 맞 춤형 보건의료 정책 설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진료과목별·지 역별 차별적 반응으로 해석하고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 자원 배분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 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정책적 의의가 있다.